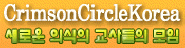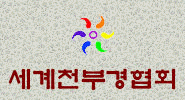지혜의 소리
글 수 1,249
十六. 無餘地
瑜伽十七地의 終位인 無餘依地의 略稱으로서 共十地의 十佛地에 當하는 妙覺의 位니 四覺 中 本覺을 除하고 十六地에 按配하면 이가 究竟覺이오 四地까지가 相似覺 五地부터 隨分覺이며 五忍으로 按配하면 四地까지 伏忍, 八地까지 信忍, 十地까지 順忍, 十四地까지 無生忍, 終二地가 寂滅忍으로서 三地까지가 下伏忍(習忍), 四 加行地 中 明得定과 明增定이 中伏忍(性忍), 印順定이 上伏忍(道種忍), 五·六 合地가 下信忍, 七地가 中信, 八地가 上信忍, 九地가 下順忍, 十地가 中順忍, 十一地가 上順忍, 十二地가 下無生忍, 十三地가 中無生忍, 十四地가 上無生忍, 十五地가 下寂滅忍, 六十地가 上家滅忍인 바 이를 十四忍이라고도 云하고 上寂滅忍을 除하야 十三觀門이라고도 謂하나니.
且 空·性·相 三宗은 元來 橫的으로 揀別할 바 않이오 縱的으로 그 程度를 各示한다면 伏·信·順 等 三忍은 相宗이오 無生忍은 性宗이며 寂滅忍은 空宗이니라 그리고 四加行位·十信·十住·十行·十廻向·十地·等覺·妙覺 等 諸位를 都合한 五十六位說, 等覺位를 除한 五十五說, 四加行位를 除한 五十二位 或 五十一位說, 十信位를 外凡夫位라 하야 이를 除한 四十二位 或 四十一位說 等이 有하고
且 十住·十行·十廻向을 內凡業位 或 三賢位라 云하며 十地를 十聖位라 謂하는 三賢十聖說, 初·二·三地를 三賢位, 四地를 入聖之門, 五地부터 十地까지를 六聖位라 云謂하는 三賢六聖說 等이 有하는 바 筆者는 五十五位說과 三賢六聖說을 支持하는 同時에 五十五位를 漸次한 次第漸修說을 打破하고 內의 五十位에 있어 五位十重 又는 十位五重으로 縱橫 觀擦하야 五蘊皆空을 證하는 境地료서 곧 五智如來를 成就하는 方便이라 云하오니
三界 四大의 色陰을 걷고 諸法空을 證하면 비로소 正信이 生할새 初信이오 受陰을 걷고 二無我를 證하면 初發心의 歡喜地에 住할새 初發心住요 想陰을 걷고 分別心을 除却하면 如來의 妙德으로써 十方에 隨順하야 歡喜로 行할새 初歡喜行이오 行陰을 걷고 一切에 通하면 一切衆生을 救護할새 初救護-切衆生廻向이오 識陰을 걷고 처음으로 正覺에 登하야 歡喜踊躍할새 初歡喜地며 且 加行功德으로써 初地를 成就하면 初信과 같은 信이 生하고 初住와 같은 地에 住하고 初行과 같이 行하고 初廻向과 같이 廻向하나니 餘皆 倣此할지오, 加之에 初·二地란 色陰 三·四地란 受陰 五·六地란 想陰 七·八地란 行陰 九·十地란 識陰을 걷는 等의 果位로서 加行이란 因位일새
勤策修行하야 此等 五十位를 圓滿 成就하면 곧 妙覺이라 名하니 解脫十六地란 菩薩十地를 根幹으로 하고 聲聞, 緣覺十地, 三乘共十地, 密敎十地, 瑜伽十七地, 信·住·行·廻向 等 四의 十位, 五 相成身位, 五忍, 十三觀門, 四加行i道 等을 枝葉으로 하야 顯密을 會通한지라 修者一初生三歸地하고 乃至 十六生無餘地하야 究竟 成就할지니 正히 十六生成佛說에 合하니라 (聲聞+緣覺+菩薩=解說+四地까지) 甲申夏 碧山閑人 撰
16에 무여지(無餘地)라, 열반에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는데 해석이 구구합니다. 유가17지의 마지막 위인 무여의지(無餘依地)의 약칭으로서 공십지의 10. 불지(佛地)에 당하는 묘각(妙覺)의 자리니, 4각중 본각(本覺)을 제하고 16지에 안배하면 이가 구경각(究竟覺)이요, 4지까지가 상사각(相似覺), 5지부터 수분각(隨分覺)이며, 5인(忍)으로 안배하면 4지까지 복인(伏忍), 8지까지 신인(信忍), 11지까지 순인(順忍), 14지까지 무생인(無生忍), 나머지 2지가 적멸인(寂滅忍)으로서 3지까지가 하복인(下伏忍:習忍), 4가행지(四加行地) 중 명득정과 명증정이 중복인(中伏忍:性忍), 인순정(印順定)이 상복인(上伏忍:道種忍), 5, 6합지가 하신인(下信忍), 7지가 중신인(中信忍), 8지가 상신인(上信忍), 9지가 하순인(下順忍), 10지가 중순인(中順忍), 11지가 상순인(上順忍), 12지가 하무생인(下無生忍), 13지가 중무생인(中無生忍), 14지가 상무생인(上無生忍), 15지가 하적멸인(下寂滅忍), 16지가 상적멸인(上寂滅忍) 인바 이를 14인(忍)이라고도 말하고 상적멸인을 제하여 13관문(觀門)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공(空)·성(性)·상(相) 3종(宗)은 원래 횡적으로 간별할 바 아니요, 종적으로 그 정도를 각각 시설한다면 복(伏)·신(信)· 순(順) 등 3인은 상종(相宗)이요, 무생인은 성종(性宗)이며 적멸인은 공종(空宗)이니라, 그리고 4가행위(四加行位)·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등 제위를 도합한 56위설 또는 등각위를 제한 5위설 또는 4가행위를 제한 52위설 혹은 51위설 또는 십신위 (十信位)를 외범부위(外凡夫位)라 하여 이를 제한 42위설 혹은 41위설 등이 있고,
또는 십주·십행·십회향을 내범부위(外凡夫位) 혹은 삼현위(三賢位)라 하며, 십지를 십성위(十聖位)라 이르는 삼현십성설(三賢十聖說). 또는 초·2·3지를 삼현위(三賢位), 4지를 입성지문(入聖之門), 5지부터 10지까지를 육성위(六聖位)라 말하는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 등이 있는데,
필자(금타 스님)는 55위설과 삼현육성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55위를 점차한 차제점수설(次第漸修說)을 타파하고 내(內)의 50위에 있어 오위십중(五位十重) 또는 십위오중(十位五重)으로 종횡 관찰하여 오온개공을 증득하는 경지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삼계(三界) 사대(四大)의 색음(色陰)을 걷고, 우리 중생이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색 곧 물질이 있다고 하는 유병(有病)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지금 없다고 밝히는데 하물며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는 불자들이 유병에 걸리면 공부가 안됩니다. 꼭 색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법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반야바라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야지혜에 어두우면 보시(布施)도 제대로 못되고 또는 사회운동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가장 소중한 보배가 제법공(諸法空)자리를 증득하게 하고 제법공도리를 깨닫기 위한 신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법공을 증해야 비로소 정신(正信)이 생하니 초신(初信)이우 수음(受陰)을 걷고 이무아(二無我: 我空·法空)를 증(證)하면 초발심의 환희지에 머무를새 초발심주(初發心住), 상음(想陰)을 걷고 분별심을 없애버리면 여래의 묘덕으로써 시방에 수순하여 환희로 행할새 초환희행(初歡喜行)이요, 행음(行陰)을 걷고 일체에 통하면 일체 중생을 구호할새 초구호일 체중생회향(初救護一切衆生廻向)이요, 식음(識陰)을 걷고 처음으로 정각(正覺)에 등(登)하여 환희용약할새 초환희지(初歡喜地)며 또는 가행공덕으로써 초지(初地)를 성취하면 초신(初信)과 같은 신이 생하고 초주(初住)와 같은 지에 주하고 초행(初行)과 같이 행하고, 초회향(初廻向)과 같이 회향하나니, 나머지는 다 이와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초·2지란 색음(色陰), 3·4지란 수음(受陰), 5·6지란 상음(想陰), 7·8지란 행음(行陰), 9·10지란 식음(識陰)을 걷는 등의 과위(果位)로서, 가행(加行)이란 인위(因位)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러한 50위를 원만성취하면 곧 묘각(妙覺)이라 이름하니 해탈십육지란 보살십지를 근간으로 하고 성문십지, 연각십지, 삼승공십지, 밀교십지, 유가십칠지, 신(信)·주(住)·행(行)·회향(廻向) 등 넷의 10위,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 오인(五忍), 십삼관문(十三觀門), 사가행(四加行) 등을 지엽으로 하여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를 회통(會通)한지라, 수행자는 처음에 삼보에 귀의하고 점차 수행하여 16무여지(無餘地)에 이르러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이니 바로 십육생성불설(十六生成佛說)에 합당합니다.
제4절 수도(修道)의 위차(位次)
다음은 수도(修道)의 위차(位次)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타 스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금강심론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금강심론에 미처 안 나와 있는 것도 각 경론에서 인용하여 한 체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엄경(華嚴經)의 보살십지(菩薩十地)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유식(唯識)의 십바라밀(十波羅蜜) 또는 수릉엄경(首楞嚴經)의 오십육위사만성불위 (五十六位四滿成佛位), 그 다음에 금강심론의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또 인왕경(仁王經) 교화품에 있는 오인십삼관문(五忍十三觀門), 또는 지도론(智度論)에 있는 구차제정(九次第定), 그 다음에 유가론의 유가십칠지(瑜伽十七地), 그 다음에 지도론에 있는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 그리고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에 있는 성문십지(聲聞十地), 연각십지(緣覺十地), 또는 보리심론(菩提心論)에 있는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입니다. 보리심론은 용수보살이 저술한 논장입니다. 다음에 유식론에 있는 유식오위(唯識五位), 천태 대사 지관론(止觀論)에 있는 육즉(六卽), 구사론(俱舍論)에 있는 사도(四道), 비장보론(秘藏寶論)의 십주심(十住心), 비장보론을 지은 분은 일본의 공해(弘法空海 774∼835 日本 眞言宗의 開祖)꼴 대사입니다. 또 십우도서(十牛圖序)는 중국의 확암지원(廓庵志遠)선사의 창설이라 하며 다른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성불하는 계위를 한 체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선으로 갈라놓았는데 두 선 위에는 욕계(欲界) 곧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위(凡夫位)이고 그 아래는 깨달은 성자친(聖者位)입니다. 성자(聖者)나 현자(賢者)에 대해서도 경론에 따라 달리 표현하여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진여불성(眞如佛性)을 증득(證得)함을 기준하여 성자(聖者)라 표현하였습니다.
맨 나중에 십주심(十住心)과 십우도서(十牛圖序)는 그런 계위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보살십지(菩薩十地)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경론을 근거로 하여 대비회통(對比會通)한 수행(修行)과 수도(修道)의 위차(位次)입니다.
★ page 545. 546. 도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
제5절 삼계 해탈(三界解脫)
1. 삼계(三界)
凡夫가 生死往來하는 世界를 三에 分하니
一에 欲界란 淫欲과 食欲을 主로 하고 諸說을 從으로 한 有情의 世界로서 上은 六欲天으로부터 中은 人界의 四大洲를 經하야 下는 無間地獄에 至하기까지를 云함이오
二에 色界란 色은 質碍의 義으로서 有形의 物質을 云함이니 此 界는 欲界의 上에 在하야 淫·食 二欲을 主로 한 諸欲을 離한 有情의
世界로서 身體나 依處나 物質的 物은 總히 殊妙精好할새니 此 色界를 禪定의 淺深鹿妙에 由하야 四級의 四禪天이라 或은 靜慮라 云하고 此中에서 或은 十六天을 立하며 或은 十七天을 立하며 或은 十八天을 立함이오
三에 無色界란 物質的의 色이 都無할새 身體나 依處가 無하고 오직 心識으로써 深妙한 禪定에 住할 따름이라 다만 果報가 色界보다 勝한 義에 就하야 其 上에 在하다심이니 此에 亦是 四天이 有하야 或은 四無色이라 四空處라 云하는 바
要컨대 三界란 色陰을 銷却하는 三品의 程度를 示한 者로서 枝末無明인 六境이 欲界요 根本無明인 六根이 色界요 受·想·行·識의 染識인 六識이 無色界라 六境·六根·六識의 十八天으로 色界를 無色界까지 延長함이 法合하니 鹿大한 欲界와 細微한 無色界는 色界에 立脚한 禪定으로써 分明히 自證劉定할지오 同時에 欲界의 四大的假想인 六境이 虛妄不實함을 信忍한 四善根이 信位에서 그의 實相을 證하고 此 地에 住하야 解行一如로써 受·想·行·識 四陰의 滅盡에 따라 常·樂·我·淨을 成就할새 名이 四滿成佛의 妙覺인 바 解悟에 있언 一念에 三界를 超越할 수 있으나 證隆에 있언 界分이 本有하니 三界를 圖示하면 如左하니라
저번에 삼계(三界)를 도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삼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를 셋으로 나누니 1. 욕계(欲界)란 음욕과 식욕을 주로 하고 모든 제반 욕심을 종으로 한, 보통은 욕계 삼욕(三欲)이라고 해서 음욕, 식욕, 잠(수면)욕으로 말합니다.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위는 6욕천(六欲天)으로부터 중(中)은 우리 인간의 사대주(四大洲)를 거쳐서 하(下)는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를 욕계라고 하며,
2. 색계(色界)란 색은 질애(質碍)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술어로 하면 질료라고 말합니다. 유형의 물질을 말함이니 이 세계는 욕계의 위에 있어서 음욕이나 식욕이나 잠욕이나 그런 욕심을 주로 한 모든 욕망을 떠난 유정의 세계로서 신체(身體)나 의처(依唜)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물(物)은 모두 다 수묘정호(殊妙精好)할새니,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물질이 아니라 이른바 광명세계(光明世界)를 말합니다. 색계에 올라가면 벌써 자기 몸도 주변도 모두 다 광명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세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하등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근원에는 하나의 광량자(光量子) 즉 가장 미세한 광자(光子)라 하는 것이 파도처럼 우주에 충만하여 우주의 장(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광명의 파동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빛으로 색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색계의 선정(禪定)이 옅고 깊고 또는 거칠고 묘한 정도에 따라서 4급의 사선천(四禪天)이라 혹은 사정려(四靜慮)라 말하고 이중에는 혹은 16천을 세우고, 혹은 17천을 세우며, 혹은 18천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욕계와 무색계는 고정적으로 욕계 6욕천 무색계 4천을 말하는데 색계는 16천이라 하는데도 있고 17천이라 하기도 하고 18천이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19천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3. 무색계(無色界)란 물질적인 색이 조금도 없으며 신체나 의지하는 환경도 없고 오직 심식(心으로써 심묘(深妙)한 선정에 머물 따름인데. 다만 그 과보가 색계보다 더 수승한 곧 업장이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다 하심이니, 이것에 역시 4천(四天)이 있어서 혹은 4무색(四無色)이라, 4공처(四空處)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3계란, 색음을 곧 번뇌의 어두움을 다 녹여서 없애는 3품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서 지말(校末)무명 곧 거칠은 번뇌인 6경(境)이 욕계요, 근본무명인 6근(根)이 색계요. 수와 상과 행과 식의 염식(染識)인 6식(識)이 무색계라. 6경·6근·6식의 18천으로 색계를 무색계까지 연장함이 법에 합하니, 6경, 6근, 6식이면 3×6은 18입니다.
추대(大)한 욕계, 본래 근(根)은 색계인데 욕계는 추대(鹿大)해서 업장 때문에 퍼뜨려져서 되었습니다. 또는 보다 더 정밀한 무색계는 색계에 입각한 선정으로써 분명히 스스로 증명해서 한계를 밝혀야 할 것이요, 동시에 욕계의 사대적(四大的) 가상(假相)인 6경 (境)이 허망부실함을 신인(信忍)한 사선근(四善根)이,
따라서 우리가 일심 정념으로 가행정진하는 것은 욕계외 모든 경계가 허망부실하다는 것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못 믿으면 4선근이 못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역시 욕계의 6경이 허망부실한 것을 깊게 못 믿으면 아직 공부는 미숙한 것입니다. 4선근이 미처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분은 자기 점검을 잘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몸뚱이도 허망하고 감투도 재물도 허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확신되어서 실제로 확립이 되어야 이른바 4선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위(身位)에서 그의 실상을 증명하고 이 경지에 머물러서 해(解)와 행(行)의 일여(一如)로써 수·상·행·식 4온(四蘊)의 번뇌가 소멸됨에 따라 상락아정(常樂我淨) 곧 상주부동하여 영생하는 상(常)과, 무한의 행복인 안락(樂)과, 삼명육통을 다하고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아(我)와, 또는 번뇌가 흔적도 없는 정(淨)이 열반사덕(涅槃四德)인 상락아정이며 우리 자성공덕(自性功德)입니다. 자성공덕을 항시 마음에다 두어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해서 영생하고, 한량없이 안락해서 일체 행복을 원만히 다 구족하고, 신통자재해서 모든 지혜공덕을 다 갖추고, 청청 무구해서 조금도 번뇌의 때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비로소 상실된 자기 고향,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자아의 회복, 상실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얄팍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오한 상락아정의 무량공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성은 깊고도 묘하고 공덕원만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성의 존엄을 말하는 것은 이 존엄성이 다른 것과 비교 할 수가 없으니까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뭘 좀 알고, 자유를 좀 구하고, 그런 정도로 존엄스럽다고 하면 그것은 존엄한 인간성의 모독입니다.
상락아정을 성취할새 이름이 사만성불(四滿成佛)이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원만입니다. 믿음으로 원만, 해석으로 원만 또는 행으로 원만, 증명으로 원만 입니다. 이러한 사만성불이 묘각(妙覺)인 바 해오(解悟)에 있어서는 일념(一念)제 삼계를 초월할 수 있으나 증오(證悟)에는, 증명하는 깨달음에는 계분(界分) 곧 자기 업장의 소멸에 따른 차서가 본래 있는 것이니 삼계를 도시(圖示)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5절 삼계 해탈(三界解脫)
1. 삼계(三界)
凡夫가 生死往來하는 世界를 三에 分하니
一에 欲界란 淫欲과 食欲을 主로 하고 諸說을 從으로 한 有情의 世界로서 上은 六欲天으로부터 中은 人界의 四大洲를 經하야 下는 無間地獄에 至하기까지를 云함이오
二에 色界란 色은 質碍의 義으로서 有形의 物質을 云함이니 此 界는 欲界의 上에 在하야 淫·食 二欲을 主로 한 諸欲을 離한 有情의
世界로서 身體나 依處나 物質的 物은 總히 殊妙精好할새니 此 色界를 禪定의 淺深鹿妙에 由하야 四級의 四禪天이라 或은 靜慮라 云하고 此中에서 或은 十六天을 立하며 或은 十七天을 立하며 或은 十八天을 立함이오
三에 無色界란 物質的의 色이 都無할새 身體나 依處가 無하고 오직 心識으로써 深妙한 禪定에 住할 따름이라 다만 果報가 色界보다 勝한 義에 就하야 其 上에 在하다심이니 此에 亦是 四天이 有하야 或은 四無色이라 四空處라 云하는 바
要컨대 三界란 色陰을 銷却하는 三品의 程度를 示한 者로서 枝末無明인 六境이 欲界요 根本無明인 六根이 色界요 受·想·行·識의 染識인 六識이 無色界라 六境·六根·六識의 十八天으로 色界를 無色界까지 延長함이 法合하니 鹿大한 欲界와 細微한 無色界는 色界에 立脚한 禪定으로써 分明히 自證劉定할지오 同時에 欲界의 四大的假想인 六境이 虛妄不實함을 信忍한 四善根이 信位에서 그의 實相을 證하고 此 地에 住하야 解行一如로써 受·想·行·識 四陰의 滅盡에 따라 常·樂·我·淨을 成就할새 名이 四滿成佛의 妙覺인 바 解悟에 있언 一念에 三界를 超越할 수 있으나 證隆에 있언 界分이 本有하니 三界를 圖示하면 如左하니라
저번에 삼계(三界)를 도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삼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를 셋으로 나누니 1. 욕계(欲界)란 음욕과 식욕을 주로 하고 모든 제반 욕심을 종으로 한, 보통은 욕계 삼욕(三欲)이라고 해서 음욕, 식욕, 잠(수면)욕으로 말합니다.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위는 6욕천(六欲天)으로부터 중(中)은 우리 인간의 사대주(四大洲)를 거쳐서 하(下)는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를 욕계라고 하며,
2. 색계(色界)란 색은 질애(質碍)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술어로 하면 질료라고 말합니다. 유형의 물질을 말함이니 이 세계는 욕계의 위에 있어서 음욕이나 식욕이나 잠욕이나 그런 욕심을 주로 한 모든 욕망을 떠난 유정의 세계로서 신체(身體)나 의처(依唜)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물(物)은 모두 다 수묘정호(殊妙精好)할새니,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물질이 아니라 이른바 광명세계(光明世界)를 말합니다. 색계에 올라가면 벌써 자기 몸도 주변도 모두 다 광명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세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하등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근원에는 하나의 광량자(光量子) 즉 가장 미세한 광자(光子)라 하는 것이 파도처럼 우주에 충만하여 우주의 장(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광명의 파동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빛으로 색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색계의 선정(禪定)이 옅고 깊고 또는 거칠고 묘한 정도에 따라서 4급의 사선천(四禪天)이라 혹은 사정려(四靜慮)라 말하고 이중에는 혹은 16천을 세우고, 혹은 17천을 세우며, 혹은 18천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욕계와 무색계는 고정적으로 욕계 6욕천 무색계 4천을 말하는데 색계는 16천이라 하는데도 있고 17천이라 하기도 하고 18천이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19천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3. 무색계(無色界)란 물질적인 색이 조금도 없으며 신체나 의지하는 환경도 없고 오직 심식(心으로써 심묘(深妙)한 선정에 머물 따름인데. 다만 그 과보가 색계보다 더 수승한 곧 업장이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다 하심이니, 이것에 역시 4천(四天)이 있어서 혹은 4무색(四無色)이라, 4공처(四空處)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3계란, 색음을 곧 번뇌의 어두움을 다 녹여서 없애는 3품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서 지말(校末)무명 곧 거칠은 번뇌인 6경(境)이 욕계요, 근본무명인 6근(根)이 색계요. 수와 상과 행과 식의 염식(染識)인 6식(識)이 무색계라. 6경·6근·6식의 18천으로 색계를 무색계까지 연장함이 법에 합하니, 6경, 6근, 6식이면 3×6은 18입니다.
추대(大)한 욕계, 본래 근(根)은 색계인데 욕계는 추대(鹿大)해서 업장 때문에 퍼뜨려져서 되었습니다. 또는 보다 더 정밀한 무색계는 색계에 입각한 선정으로써 분명히 스스로 증명해서 한계를 밝혀야 할 것이요, 동시에 욕계의 사대적(四大的) 가상(假相)인 6경 (境)이 허망부실함을 신인(信忍)한 사선근(四善根)이,
따라서 우리가 일심 정념으로 가행정진하는 것은 욕계외 모든 경계가 허망부실하다는 것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못 믿으면 4선근이 못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역시 욕계의 6경이 허망부실한 것을 깊게 못 믿으면 아직 공부는 미숙한 것입니다. 4선근이 미처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분은 자기 점검을 잘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몸뚱이도 허망하고 감투도 재물도 허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확신되어서 실제로 확립이 되어야 이른바 4선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위(身位)에서 그의 실상을 증명하고 이 경지에 머물러서 해(解)와 행(行)의 일여(一如)로써 수·상·행·식 4온(四蘊)의 번뇌가 소멸됨에 따라 상락아정(常樂我淨) 곧 상주부동하여 영생하는 상(常)과, 무한의 행복인 안락(樂)과, 삼명육통을 다하고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아(我)와, 또는 번뇌가 흔적도 없는 정(淨)이 열반사덕(涅槃四德)인 상락아정이며 우리 자성공덕(自性功德)입니다. 자성공덕을 항시 마음에다 두어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해서 영생하고, 한량없이 안락해서 일체 행복을 원만히 다 구족하고, 신통자재해서 모든 지혜공덕을 다 갖추고, 청청 무구해서 조금도 번뇌의 때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비로소 상실된 자기 고향,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자아의 회복, 상실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얄팍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오한 상락아정의 무량공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성은 깊고도 묘하고 공덕원만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성의 존엄을 말하는 것은 이 존엄성이 다른 것과 비교 할 수가 없으니까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뭘 좀 알고, 자유를 좀 구하고, 그런 정도로 존엄스럽다고 하면 그것은 존엄한 인간성의 모독입니다.
상락아정을 성취할새 이름이 사만성불(四滿成佛)이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원만입니다. 믿음으로 원만, 해석으로 원만 또는 행으로 원만, 증명으로 원만 입니다. 이러한 사만성불이 묘각(妙覺)인 바 해오(解悟)에 있어서는 일념(一念)제 삼계를 초월할 수 있으나 증오(證悟)에는, 증명하는 깨달음에는 계분(界分) 곧 자기 업장의 소멸에 따른 차서가 본래 있는 것이니 삼계를 도시(圖示)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2. 사선정 (四禪定)
前의 四善根이란 곧 地·水·火·風 四大의 淦界인 色蘊을 打成一하는 境界요
四禪定이란 密界의 그 實色을 證見하는 同時에 受·想·行·識 四蘊의 四禪으로써 常·樂·我·淨 四德의 四定에 轉入하는 境界니 곧 四無色의 境界一相을 觀察함은 四禪이오 그의 思惟로써 一行함은 四定이라
空無邊處를 觀하고 念하야 色界의 金塵相을 見하고 欲界의 虛妄相을 一掃한 涅槃界의 淨德을 證함은 初禪定이오
識無邊唜를 觀하고 念하야 微塵의 阿★550아래서 둘째줄★色을 見하는 同時에 水性的 受陰을 걷고 淨心의 我德을 證함은 二禪定이오 無所有處를 觀하고 念하야 色究竟의 極微相을 見하는 同時에 火性的 想陰을 轉하야 一道光明의 常德을 證함은 三禪定이오
非想非非想處를 觀하고 念하야 微微의 隣虛相을 見하는 同時에 風性的 行陰을 轉하야 樂德을 證함은 四禪定일새 四禪定이란 곧 姿姿卽 寂光土임을 見하고 娑婆世界 그대로 極樂世界임을 證함이니라
그리하야 欲界의 惑網을 超脫하고 色界에 生할새 諸功德을 生하는 依地根本이 되는지라 四禪定을 本禪이라고도 稱하니 身에 動·痒·輕·重·冷·煖·澁·滑의 八觸이 生하고 心에 空·明·定·智·善心·柔軟·喜·樂·解脫·境界相應의 十功德이 生함은 初禪定에 入한 證相이며 初禪부터 鼻·舌 二識이 無하고 二禪부턴 五識을 모두 離하고 다만 意識만 有하니 或은 眼·耳· 身 三識의 喜受가 有하야 意識과 相應하고 意識의 樂受가 有하야 三識과 相應하는 바 意識의 喜悅이 鹿大할새 喜受요 樂受가 않이로되 三禪엔 亦是 意識만이 有하야 樂·捨 二受가 相應하되 怡悅의 相이 至極淨妙할새 樂受며 四禪엔 亦是 意識뿐이오 오직 捨受와 相應할 뿐이니라
그리고 相에 있어 四禪에 각각 三級씩 有하고 性에 있어 四級 乃至 八級을 言하는 바 天이란 密界의 地相으로서 色界 十二天에 無色界의 淨梵地를 加하야 色界라 總稱함도 有하니 곧 禪定의 次序니라
그런데 四大의 實色인 줄 是認할 뿐이오 四大의 虛相을 離한 實相임을 感得못함은 凡夫의 所見일새요 四陰을 四德으로 轉換못함은 外道의 淺見일새 다만 根機에 있을 따름이오 三界에 있지 않음을 了知하는 同時에 四禪定을 外道禪이라 貶하고 近來의 死禪 곧 無誰定이나 妄想定인 邪定의 修行을 能事로 自認하는 啞羊僧을 警戒하노라. 四禪定이란 三乘聖者의 共修하는 根本禪임을 再吟味하기 바라며 滅盡定을 거쳐 究竟成統할지니라.
이 사선정(四禪定)은 앞에서 대강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근본선(根本禪)으로서 모든 선정의 근본이 되며 증오(證悟)를 위한 필수(必須)적인 선법(禪法)입니다. 금강심론에 한결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합시다.
앞의 사선근(四善根)이란 곧 지·수·화·풍 4대(四大)의 현계(顯界) 곧 나타나 있는, 우리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대 유한적인 세계라는 말입니다. 현계의 반대가 밀계(密界)입니다. 색온(色蘊)을 타성일편(打成一片)하는 경계요 곧, 모두를 하나의 공상(空相)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선근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물질이요 내 몸뚱이요, 이런 것들을 처부셔 공상(空相)으로 통찰하지 못하면은 4선근은 못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한 말로 말하면 4대 색온이 다 비었다고 달관(達觀)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까지 포함하여 천지 우주의 모든, 있는 것이 다 비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본래로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해 나가면 차근차근 비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비어지면 참선이 잘못 되는 것이지요. 원래가 빈 것인데 안 비어질 까닭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욕심이나 분노심이 점차로 줄어가고 상(相)이 가셔가겠죠, 상이라는 것은 내나 무엇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요, 있다고 집착해서 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인가? 수·상·행·식(受想行識)인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습기(習氣)를 없애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은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것이 모두 다 비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스며 있는 오염(汚染)을 차근차근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경(佛經)의 근본 요지는 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불교에는, '네 몸뚱이가 비었다'고 가르치면 소중히 아끼는 자기 몸뚱이 인데 상식 밖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12년 동안이나 중생 근기에 따라 가르쳐가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대가 바로 비었느니라, 그대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고 그대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잠시 구성되어 있으니 본래로 다 비었느니라' 하고 일체가 다 비었다는 제법공(諸法空) 도리를 또한 22년 동안이나 말씀했던 것입니다. 공.(空)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기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제법공 도리, 반야(般若)의 지혜가 없으면 참선도 못되고 불교도 아닙니다. 염불(念佛)도 제법공 자리에 입각해야지 그렇게 못하면 하나의 방판에 불과합니다. 극락세계가 십만억 국토 저 밖에 가 있다 하면 친지 우주가 다 비었는데 어디 밖이 있고 안이 있습니까? 천지 우주는 이대로 극락세계요, 이대로 광명세계입니다. 극락세계의 별명이 광명세계요, 화장(華藏) 세계입니다. 화장세계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춘 찬란 무변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영생불멸의 세계가 연화장(蓮華藏)세계이고 극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實存)적 세계인데 우리 중생의 업장으로 물질이라는 환상에 얽매여서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하는 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을 떼어버리면 본래 극락세계인지라 극락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 사바세계가 곧 적광토(寂光土)라, 사바세계를 떠나서 저 밖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도 떠나지 않고 바로 내 몸 이대로 부처요, 이 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못 보는 데에 허물이 있는 것이지, 극락세계와 사바세계, 예토(穢土)와 정토(淨土)가 따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절박한 시대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여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교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한결같이 실상(實相)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타성일편(打成一片)이란 말을 거듭 역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체 만법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한 인생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래로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려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래저래 막히고 거리끼면 자기 마음도 항시 의단이 풀리지 않고 마음의 흐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불성(佛性)이요, 불성이 아닌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질이란 환상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진여불성(眞如佛性)만 남지 않겠습니까?
사선정(四禪定)이란 밀계(密界)의 그 실색(實色)을 증명해서 보는 동시에 수·생·행·식 4온(蘊)의 4선(禪)으로써 상·락·아·정 4덕(四德)의 4정(定)에 전입(轉入)하는 경계이니 곧 4무색(無色)의 경계일상(境界一相)을 관찰함은 4선(禪)이요, 그의 사유(思惟)로써 일행(一行)함은 4정(定)입니다.
공무변처(空無邊處)를 관(觀)하고 념(念)하여 색계의 금진상(金塵相)을 견(見)하고, 금진상을 견해야 금강지입니다.
관법(觀法)을 관법 외도(外道)라고 폄(貶)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도 관법이요 6조 스님까지 한결같이 관법인데 관법이 외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미숙한 풍토입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법집(法執), 불경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아무렇게나 국집하는 그런 법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함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다 관법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관조(觀照)하는 수행법 속에 모든 수행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계의 허망상을 없애고 열반계의 정덕(淨德)을 증험하는 것이 초선정(初禪定)입니다.
식무변처(識無邊處)를 관하고 념하여 미진(微塵)의 아누색(阿縟色)을 견(見)하는 동시에 수성(水性)적 수음(受陰) 곧 감수(感受)해서 얻은 번뇌를 걷고 청청한 마음의 아덕(我德)을 증(證)함은 2선정(二禪定)이요
무소유처(無所有處)를 관하고 념하여 색구경(色究竟)의 극미상(極微相)을 견(見)하는 동시에 화성(火性)적 상음(想陰)을 전(轉)하여 일도광명(一道光明)의 상덕(常德)을 증(證)함은 3선정(三禪定)입니다. 사바세계가 오로지 광명뿐인 광명정토, 광명세계로서 그런 광명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해 있으니까 상덕입니다.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를 관하고 념하여 미미의 인허상(隣虛相)을 견(見)하는 동시에 풍성(風性)적 행음(行陰)을 전하여 락(樂)덕을 증함은 4선정(四禪定)일새 4선정이란 곧 사바세계 즉 적광토(寂光土)임을 견(見)하고 사바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임을 증험하는 선정입니다.
그리하여 욕계의 혹망(惑網) 곧 욕계의 번뇌의 그물을 초탈하고 색계에 생할새 모든 공덕을 생하는 의지(依地) 근본이 되는지라, 욕계의 욕심 뿌리가 뽑혀 버려야 공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을 하고 싶고 뭣인가 남을 위하여 애쓰고, 알려고 하지만 욕계를 못 떠나면 안됩니다.
사선정(四禪定)을 본선(本禪)이라고도 칭하니 몸에는, 욕계를 떠나갈 때에는 동·양·경·중·냉 ·난·삽·활(動痒輕重冷煖澁滑)이라, 몸이 움직이고, 또는 가렵고, 더러는 몸이 가볍거나, 무겁고, 더러는 몸이 차고, 따습고, 더러는 깔깔하고, 또는 윤택이 있고 부드럽고 이러한 팔촉(八觸)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는 텅 다 비어서 공(空)이라, 맑아서 명(明)이요 또는 마음이 일심지(一心支)가 되어서 하나로 통일되니까 정(定)이요, 지혜가 밝아지니까 지(智)요, 또는 선심(善心)이라, 굉장히 마음이 선량해져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때문에 남을 성가시게 한다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한다거나 자기만 잘 산다든가 할 수 없는 이른바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저절로 우러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유연(柔軟)이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강강한 마음이 가시어 누구와도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같은 마음이요 같은 몸이거니 누구와 싸우고 필요 없는 시비를 하겠습니까? 희(喜)라, 기쁘고 락(樂)이라, 즐거움이고 또는 해탈(解脫)이고, 경계상응(境界相應)이라, 경계에 따라 이해가 되고 알맞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십공덕(十功德)이 생함은 초선정에 들어간 증상이며,
초선부터 비·설(鼻舌) 2식(二識)이 없어서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오관(五官)을 떠나게 됩니다.
2선부터는 5식(五識)을 모두 떠나서 몸으로 촉감도 못 느끼고 눈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인이나 4선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듣고 보고 할 것인가? 이런 때는 차기(借起)라, 하고 싶으면 짐짓 욕계의 이근(耳根)이나 또는 안근(眼根)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식(意識)만 있는 것이니 혹은 안·이·신 3식, 눈과 귀와 또는 촉감과 3식의 희수(喜受)가 있어서 의식과 상응하고 혹은 의식의 락수(樂受)가 있어서 3식과 상응하는 바 의식의 기쁨이 거치르니 희수(喜受)요, 락수(樂受)가 아닙니다.
3선에는 역시 의식만 있어서 락수(樂受)와 사수(捨受) 즉, 즐겁게 느끼고 괴롭게 느끼는 등 고락을 못 느끼는 2수(受)가 상응하되 기쁨이 지극히 맑고 미묘하니 락수(樂受)며, 4선에서는 역시 의식 뿐이요,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相)에 있어 4선에 각각 3급씩, 초선정에 3, 또 2선에 3, 또는 3선에 3, 4선에 3급이 있습니다. 성(性)에 있어서 4급 내지 8급을 말하는 바, 천(天)이란 밀계(密界)의 지상(地相)으로서 이른바 광명세계의 지상으로서 색계 12천에 무색계의 정범지(淨梵地)를 보태서 색계라 총칭하기도 하니 곧 선정(禪定)의 차서(次序)입니다.
우리가 4선천(四禪天)과 4선정(四禪定)도 구분해야겠습니다. 4선천을 선정과 덕을 닦은 과보로써 그 하늘에 태어나 안락한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고 4선정은 범부 중생이 선정을 닦아서 번뇌를 녹임에 따라 발현되는 공덕상입니다.
그런데, 사대(四大)의 실색(實色)인 줄 시인할 뿐이요. 4대의 허상을 떠난 실상(實相)임을 감득 못함은 범부 소견이요, 중생은 4대의 실색을 못 보니까 무슨 색이라 하면 중생의 차원에서 이것도 번뇌에 때묻은 색이 아닌가 하지만 묘색(妙色)은 제법이 공(空)한 자리에 나타나는 우주에 충만한 청정적광(淸淨寂光), 정광(淨光)으로서 한계나 국한이 없습니다.
또는 사음(四陰) 곧 수·상·행·식인 우리 심리에 묻어 있는 오염된 번뇌인 4음을 사덕(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전환 못함은 외도의 천견(淺見)일새, 외도는 습기를 소멸하지 못하여 나라는 아(我)를 못 끊는 것입니다. 외도와 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도는 아(我)를 끊는 것이고 외도는 아를 못 끊는 것입니다. 멸진정(滅盡定)을 성취해야 수와 상과 행과 식에 있는 마지막 아(我)의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이므로 정도(正道)라 합니다.
다만 근기(根機)에 있을 따름이요 삼계에 있지 않음을 요지(了知)하는 동시에, 삼계란 깨달은 안목에서는 오직 청청무비한 영원한 극락세계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보아서 또는 업
장 따라서 오염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선정을 외도선(外道禪)이라 폄(貶)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근본선(根本禪)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선(死禪) 곧 죽은 선인, 바른 지혜없이 멍청히 닦는 무기정(無記定)이나, 근본 성품을 여의고 분별하고 헤아리며 닦는 망상정(妄想定)인 삿된 사정(邪定)을 닦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두들고, 염불하고, 주문 외우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아님이 없고 천지 우주는 진여불성의 청정미묘한 무량적광으로 충만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느끼고 그 자리를 안 여의고 닦아야지 그렇지 않고 분별하고 헤아리면 결국은 망상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무슨 상대유한적인 문제를 의심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망상 아닙니까? 일체가 부처라는 생각 외에 한 생각이라도 달리 일어나면 벌써 다 망(妄)이라는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청정미묘하고 일미평등한 불성뿐이다 는 생각 외에는 사실은 다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사 어록에 일념불생(一念不生)이라, 한 생각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정(邪定)의 수행을 능사로 자인하는 아양승(啞羊僧) 곧 참다운 진리를 모르고서 법을 잘못 설하는 승(僧)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선정이란 삼승성자(三乘聖者)가 공수(共修)하는, 누구나 함께 닦아야 하는 근본선(根本禪)입니다. 4선정을 이른바 근본선이라고 합니다. 근본불교의 요체는 근본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이나 버어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출가승의 자세는 좋은데 정작 수행법에 있어서는 근본선을 제대로 닦지 않는 것입니다. 참다운 비파사나(Vipasyana)는 근본선을 닦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비파사나 선을 공부하는 분도 꼭 근본선을 닦아야 부처님 당시의 아함경, 근본불교의 요체를 공부하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선은 소승권이나 대승권이나 누구나 다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번뇌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고 더디 가는 차이뿐인 것이지 꼭 근본선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타 스님도 근본선을 역설하여 재음미하기 바라며 멸진정(滅盡定)을 거쳐 구경성취(究竟成就)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선정이 구경지(究竟地)는 아닙니다. 외도와 정도가 공수(共修)하기 때문에 외도도 4선정을 닦으나 다만 아(我)를 못 떼고 머물러 버리고, 정도는 아(我)를 소멸한다는 견고부동한 대원력(大願力)으로 멸진정(滅盡定)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3. 멸진정(滅盡定)
「大乘義章」 二에 「滅盡定者는 謂諸聖人이 患心勞慮하야 暫滅心識 함이니 得一有爲의 非色心法하야 領補心處함을 名 滅盡定」이랐고 同九에 「滅受想者는 偏對受想二陰하야 彰名함이라 想絶受亡이 名 滅受想이오 滅盡定者는 通對一切의 一心心數法하야 以彰名也니 心及心法의 一切俱亡이 名爲滅盡」이랐으며 「俱舍論」 五에 如說컨대 「復有別法하니 能令心心所로 滅함을 名無想定이오 如是히 復有別法하니 能令心心所로 滅함일새 名滅盡定」이랐고 同述記 七本에 「彼心心所의 滅을 名滅定이오 恒行인 染汚의 心 等이 滅故로 卽此亦名 滅受想定이라」하야 滅盡定을 滅受想定이라고도 名하고 六識의 心心所를 滅盡하는 禪定의 名으로서 그 加行方便에 特히 受의 心所와_想의 心所를 厭忌하야 此를 滅함일새 加行에 從한 滅受想定이오 不還果 以上의 聖者가 漫槃에 假入하는 想을 起하야 此의 定에 入함일새 極長이 七日이라 滅盡定인 양 解하나
換言하면 滅盡定이란 色陰을 滅盡함에 따라 受·想·行·識 四陰의 染心을 滅盡하는 三昧의 名이니 初·二地에서 色陰을 三·四地에서 受陰을 五·六地에서 想陰을 七·八地에서 行陰을 九·十地에서 識陰을 上下品의 十重 五位로 滅盡함이오 또는 十信位에서 色陰을 十住位에서 受陰을 十行位에서 想陰을 十廻向位에서 行陰을 十地位에서 識陰을 五重 十位로 滅盡함이니 十重 五位론 十住位부터 五重 十位론 三地부터 次第로 滅盡함이니라
곧 先修後證과 先證街繼의 別은 姑捨하고 色蘊 又는 此에 染汚한 四蘊의 染心을 滅盡하고 淨心에 住하야 常樂의 一大人我를 成就하는 滅盡三昧의 名아니라
그리하야 四禪·四定에 此를 加하고 九次第定이라 稱하는 바 四禪·四定은 三乘聖者와 外道가 共修하나 第九의 滅盡定은 聖者에 限하는 同時에 外道는 法相에만 限하고 正道에 不在하며 根機에 따라 次第漸修 又는 間超와 頓超의 別이 有하니라
대승의장(大乘義章) 2에 '멸진정자(滅盡定者)는 위제성인(謂諸聖人)이 환심노려(患心勞慮)하여' 자기라는 관념을 떼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라는 관념인 아상(我相)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심노려하여, 자기란 허망한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고 애써서, '잠멸심식(暫滅心識)함이니' 잠시 동안 심식(心識)을 멸함이니, 완전히 멸하면 또 안되겠죠. 그러면 죽은 사람, 그때는 무기(無記)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시비가 다 끊어져버린, 분별심 없는 선정이 무심정(無心定)인데, 무심정은 외도가 닦는 무상정(無想定)과 정도가 닦는 멸진정(滅盡定)으로서 모두 다 4선정을 성취해야 들어가는 것인데 무상정은 외도들이 무상천의 과보를 얻기 위해서 닦기 때문에 생각이 멸하여지면 이것이 열반이라고 집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상정이고 정도는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번뇌습기를 소멸하기 위하여 잠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 제도의 원력 때문에 장시간(長時間)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승은 벌써 보살 아닙니까? 이 몸뚱이를 천만 개를 다 없애더라도 범부 중생을 모조리 바른 도리로 이끌어야겠다는 서원 때문에 보살은 오랫동안 선정락에 잠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는 찌꺼기만 없애기 위해서 잠시 동안 마음을 끊어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위(有爲)의 비색심법(非色心法)을 득(得)하여 심처(心處)를 보령(補領)함을 멸진정이라 이름하였다' 고 하였고 대승의장 9에는 '멸수상(滅受想)이란 것은 수(受)와 상(想)의 2음(陰)에 대하여 이름을 나타낸 것인데, 의식으로 감수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은 다 번뇌이니 상상한 것이 끊어지고 또 감수한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멸수상이요 또한 멸진정
은 일체의 모든 가지가지의 마음법에 대하여 이름을 나타낸 것이니 심왕법(心王法)과 심소유법(心所有法)으로서, 심(心)은 아뢰야식으로서 마음의 주체인 심왕(心王)이고 심소유법(心所有法)은 주체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법인데 이런, 심급심법(心及心法) 일체가 없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멸진(滅盡)이라' 하였으며,
구사론(俱舍論) 5에 또 말씀하시되 '다시 별법(別法)이 있으니 능히 심법과 심소유법을 멸함을 명무상정(明無想定)이라 하고 또한 다른 법이 있는데 능히 심법과 심소유법을 멸함을 명멸진정(名滅盡定)이라' 하였고,
동술기(同述記) 7본에 '피심심소(彼心心所) 곧 심왕(心王)과 심소유법을 멸함은 멸정(滅定)이요 항시 업을 짓는 염오(染汚)된 마음이 멸하니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 하여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고도 이름하고 6식(識)의 심심소(心心所)를 멸진하는 선정의 이름으로서 그 가행방편에 특히 수(受)의 심소(心所)와 상(想)의 심소(心所)를 싫어해서 이를 멸하는 것이니 가행(加行)에 따른 멸수상정이요, 불환과(不還果) 이상의 성자가 열반에 가입(假入)하는 상(想)을 일으켜서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니 극장(極長)이 7일입니다. 선정에 들어 너무 오래 있으면 보살의 중생 제도의 원력이 아닐 뿐 아니라 건강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력이 홍심(弘深)해서 이레 동안 이상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여기서부터는 금타 스님이 각 법문을 종합한 결어(結語) 입니다. ) 멸진정이란 색음(色陰)을 멸진함에 따라 수와 상과 행과 식 4음의 염심(染心)을 멸진하는 삼매의 명이니 초, 2지에서 색음(色陰)을 3, 4지에서 수음(受陰), 5, 6지에서 상음(想陰)을 7, 8지에서 행음(行陰)을, 또는 9, 10지에서 식음(識陰)을, 상하품(上下品) 십중오위(十重五位)로 멸진함이요 또는 십
신위(十信位)에서 색음을, 십주위(十主位)에서 수음을, 십행위(十行位)에서 상음을, 십회향위(十廻向位)에서 행음을, 또는 십지위(十地位)에서 식음을, 오중십위(五重十位)로 멸진함이니, 십중오위로는 십주위(十住位)로부터 오중십위로는 삼지(三地)부터 차제로 멸진함이니라.
곧 선수후증(先修後證)과, 먼저 닦고 뒤에 증득하는 수법이라든가 선증후수(先證後修)라, 먼저 증하고 뒤에 닦는 구별은 고사하고 색온(色蘊) 또는 이에 염오한 4온의 염심(染心)을 멸진하고 정심(淨心)에 주(住)하여 상락(常樂)의 일대인아(一大人我)를 성취하는 멸진삼매(滅盡三昧)의 이름이니라.
그리하여 4선(四禪), 4정(四定)에 이를 가(加)하고 9차제정(九次第定)이라 칭하는 바 4선, 4정은 삼승성자와 외도가 같이 닦으나 제 9의 멸진정은 성자에 한하는 동시에 외도는 법상(法相)에만 한하고 정도에 부재(不在)하며, 아(我)를 못 끊었기 때문에 정도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근기에 따라 차제로 점수하고 또는 간초(間超)와, 간초는 2지 3지 등 어느 정도 비약할 수 있고 또는 돈초(頓超)라, 돈초는 단번에 비약적으로 구경지까지 성취하는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선수후오(先修後悟), 선오후수(先悟後修)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오후수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수행의 길목을 알고서 닦는 것이요, 그 길목을 모르고서 애쓰고 닦아 가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선수후오입니다. 따라서 먼저 길을 알고 닦는 수법인 선오후수는 오수(悟修)요, 길도 모르고 애쓰고 닦다가 가까스로 깨닫는 선수후오는 미수(迷修)라고 합니다. 마땅히 정법 수행자는 선오후수(先悟楨修)가 되어야 열린 평온한 마음으로 한결 올바르게 정진하고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 오인 (五忍)과 십삼관문(十三觀門)
五忍과 十三觀門
舊譯 「仁王經」 敎化品에 「佛言大王하사대 五忍이 是 菩薩의 法이니 伏忍의 上·中·下와 信忍의 上·中·下와 順忍의 上·中·下와 無生忍의 上·中·下와 寂滅忍의 上·下를 名爲諸佛菩薩의 修般若波羅蜜이라」시교 同 受持品에 「大牟尼께서 言하사대 有修行十三觀門의 諸善男子가 爲大法王이라 從習忍으로 臺金剛頂이 皆購法師일새 依持하라 建立하니 汝等 大衆은 應如佛供養而供養之하라 應持百萬億天이 香과 妙華하야 而以奉上이라」시고 同 嘉祥疏에 「伏忍의 上·中·下 者는 習忍이 下요 性忍이 中이오 道種忍이 上이라 在三賢位요 信忍의 上·中·下者는 初地가 下요 二地가 中이오 三地가 上이며 順忍의 上中 下者는 四地가 下요 五地가 中이오 六地가 上이며 無生忍의 上·中·下者는 七地가 下요 八地가 中이오 九地가 上이며 寂滅忍의 上下者는 十地가 下요 佛地가 上」이랐으니
一에 伏忍이란 習忍·性忍·道鐘忍의 三성위에 在한 菩薩이 아직 煩惱의 種子는 末斷이나 此를 制伏하야 不起케 하는 忍이오
二에 信忍이란 初地부터 三地까지에서 貪惑을 斷盡하고 眞性을 見하야 正信을 얻는 忍이오
三에 順忍이란 四地부터 六池까지에서 嗔惑을 斷盡하고 菩提의 道에 順하야 無生의 果에 趣向하는 忍이오
四에 無生忍이란 七地부터 九地까지에서 痴惑을 斷盡하고 諸法無生의 理에 悟入한 忍이오
五에 寂滅忍이란 十地와 妙覺에서 渥槃의 寂滅에 究竟한 忍이라 忍은 忍可 又는 安忍의 義로서 其 理를 決定하고 不動함일새 十三觀門이란 上의 十四忍 中, 上 寂滅忍의 妙覺位를 除한 十三忍의 修法이라 十三觀門으로써 修하는 者를 大法王이라 云하시고 如佛供養하라시니라
이것은 인왕경(仁王經) 교화품(敎化品)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역(舊譯) 인왕경 교화품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왕에게 말씀하시되, '오인(五忍)이 보살의 법이니, 복인(伏忍)의 상, 중, 하와 신인(信忍)의 상, 중, 하와 순인(順忍)의 상, 중, 하와 무생인(無生忍)의 상, 중, 하와 적멸인(寂滅忍)의 상, 하를 제불보살의 수반마바라밀(修般若波羅蜜)이라'하시고, 그러니까 제불보살이 반야를 닦을 때에 이 법으로 닦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왕경 수지품(受持品)에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되, 십삼관문(十三觀門)으로 닦는 선남자가 대법왕(大法王)이 된다' 공부가 성숙되어서 자성을 깨달아야 비로소 성자이나 십삼관문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정각을 성취하게 되므로 이 법으로 닦는 수행자도 법왕이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고 하면, '습인(習忍)으로부터서 금강정(金剛頂)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법사가 되어' 수행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목을 모르면 어디만치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길목을 안다면 더디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종당에는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발심(眞發心)하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면 설사, 금생에 성불 못하면 몇생 뒤에라도 꼭 성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면 더디지 않는 것이지만 길을 모른다면 설령 금생에 약간의 수승한 공덕을 얻었다 할 지라도 중간에 중도이폐(中途而廢)하고 말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정다운 법에 의지하라고 세운 것이니, 그대들 대중은 마땅히 부처와 같이 공양해야 하나니 백만억천 천인들이 향과 묘화를 갖고서 받들어 숭앙한다' 하셨습니다. 아직 범부니까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십삼관문으로 닦는다면 일반 대중들은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할 것이며, 백만억천 무수한 천인들이 십삼관문으로 수행하는 이들을 꽃과 향으로써 받들어 숭앙한다는 말입니다.
동(同) 가상소(嘉祥疏)에 '복인(伏忍)의 상, 중, 하는 습인(習忍)이 하요, 성인(性忍)이 중이요, 도종인(道種忍)이 상이라, 이것이 재3현위(在三賢位)요' 아직 성자의 지위가 되기 전에 닦아 나가는 과정들을 인법(忍法)이라는 명분으로 가른다면 이른바 복인인데, 복인(伏忍)에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은 번뇌를 다는 떼지 못하고 조복시킨다,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견도할 때, 견성오도할 때는 단(斷)이요, 그전에는 복(伏)이라는 말입니다. 복(伏)이란 제복(制伏)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써서 조작(造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끊어 버리면 조작이 없이 임운(任運)이 되는 것이지요. 화두나 염불이나 주문이나 공부를 익혀 나가는 습인(習忍)이 하(下)고, 더욱 익혀서 확신이 서가는 정도인 성인(性忍)이 중(中)이요, 그 다음은 도종인(道種忍)이라, 이미 확실히 신해(信解)가 생겨 가지고 우리 잠재 의식에다 종자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한사코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종자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도종인까지는 아직은 현위(賢位)요, 성자의 지위는 못됩니다.
그 다음에 '신인(信忍)의 상, 중, 하는 초지가 하요' 초지부터는 이미 환희지를 성취한, 곧 견도한 성자입니다. 그리고 초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보살십지에 의거한 것입니다. '2지가 중이요, 3지가 상이며' 복인에서는 현자라 하더라도 아직은 성자가 아닌 범부지이므로 이런 현자의 지위는 확실한 깊은 신앙 즉 정신(正信)은 아직은 못 갖고 항시 의단(疑團)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진여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상(相)도 미처 여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지에서 견도하면 그때는 확실히 불성을 보기 때문에 비로소 참다운 정신(正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信忍)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인(順忍)의 상, 중, 하자는 4지(地)가 하요, 5지가 중이요, 6지가 상이며' 순인이라고 한 것은 법성(法性)에 수순해서 조금도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없고 삼업(三業)을 여법히 청정하게 행위한다는 말입니다.
'무생인(無生忍)의 상, 중, 하자는 7지가 하요, 8지가 중이요, 9지가 상이며' 무생인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온전히 체험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멸인(寂滅忍)의 상하자는 10지가 하요, 불지(佛地)가 상이라고 하였으니 적멸인에는 중(中)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찰나이기'때문에 가운데다 중(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에 복인(伏忍)이란, 습인·성인·도종인의 3현위에 재(在)한 보살이 아직 번뇌의 종자는 끊지 알았으나 이를 제복하여, 억제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인(忍)이요,
2에 신인(信忍)이란, 초지부터 3지까지에서 탐혹(貪惑)을 단진(斷盡)하고 진성(眞性)을 견(見)하여 정신(正信)을 얻는 인(忍)이요, 따라서 보살 초지부터는 견도(見道)지위입니다.
견도지위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생성(異生性)이라는 범부의 성품을 떠나서 성자의 참다운 성품인 정성(正性)이 되므로 견도할 때를 가리켜 정성리생(正性離生)이라 합니다. 즉 범부가 사물을 바르게 통찰을 못하고 달리 볼 수밖에 없는 분별시비를 떠나서 정성인 진여불성 경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3지까지에서 탐혹을 단진하고 진성을 견하여 비로소 바른 신앙을, 확고부동한 후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3에 순인忍)이란, 4지부터 6지까지에서 진혹(瞋惑)을 단진하고 보리(菩提)의 도에 순(順)하여 무생(無生)의 과(果)에, 불생불멸의 과에 취향(趣向)하는 인이요,
4에 무생인(無生忍)이란, 7지부터 9지까지에서 치혹(痴惑)을, 탐·진·치 번뇌 가운데 탐혹은 가장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진혹이 끊어지고 마지막에 무명인 치혹을 단진하고 제법무생(諸法無生)의 리(理)에, 모든 법이 불생불멸한 뜻에 깨달아서 들어감이요.
5에 적멸인(寂滅忍)이란, 10지와 묘각(妙覺)에서 열반의 적멸(寂滅)에 구경(究竟)한 인(忍)이라, 열반 곧 적멸에 사무쳐 다 깨달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忍)은 인가(忍可) 또는 안인(安忍)의 뜻으로써, 인은 참을 인자 아닙니까? 진여의 도리를 확실히 믿고 안주하며, 편안히 머물러 동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3관문이란 위의 14인 중, 복인에 3이 있고, 신인에 3, 순인에 3, 무생인에 3, 적멸인에 2가 있어 14인(忍)인데, 상적멸인의 묘각위를 제한, 적멸인이 바로 묘각이므로 제하고서 13인(忍)의 수법(修法)이라, 수행하는 과정이 13인의 수법이라 13관문으로 닦는 자를 대법왕(大法王)이라 말씀하시고 여불공양하라 하시니라 곧 부처같이 공양하라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두에서 말씀드린 선오후수(先悟後修)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석가모니께서 출현하셨을 때에 다른 위대한 성자가 계셨더라면 석가모니께서도 6년 고행이나 그렇게 많은 수도를 안하셨겠지요,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나오셨더라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인생과 우주의 모든 길을 온전히 밝혀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길목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목을 모르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증선(暗證禪)이라, 우리가 암중모색한다는 말입니다. 내 공부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자기 점검을 못하고 또는 다른 이들의 정도를 간별을 못합니다. 도인이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지 우리가 저 분이 어느 정도인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십삼관문(十三觀門)같은 법문을 안다면 자기 공부 길에도 헤매지 않고 다른 수행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셧길 바랍니다...()
瑜伽十七地의 終位인 無餘依地의 略稱으로서 共十地의 十佛地에 當하는 妙覺의 位니 四覺 中 本覺을 除하고 十六地에 按配하면 이가 究竟覺이오 四地까지가 相似覺 五地부터 隨分覺이며 五忍으로 按配하면 四地까지 伏忍, 八地까지 信忍, 十地까지 順忍, 十四地까지 無生忍, 終二地가 寂滅忍으로서 三地까지가 下伏忍(習忍), 四 加行地 中 明得定과 明增定이 中伏忍(性忍), 印順定이 上伏忍(道種忍), 五·六 合地가 下信忍, 七地가 中信, 八地가 上信忍, 九地가 下順忍, 十地가 中順忍, 十一地가 上順忍, 十二地가 下無生忍, 十三地가 中無生忍, 十四地가 上無生忍, 十五地가 下寂滅忍, 六十地가 上家滅忍인 바 이를 十四忍이라고도 云하고 上寂滅忍을 除하야 十三觀門이라고도 謂하나니.
且 空·性·相 三宗은 元來 橫的으로 揀別할 바 않이오 縱的으로 그 程度를 各示한다면 伏·信·順 等 三忍은 相宗이오 無生忍은 性宗이며 寂滅忍은 空宗이니라 그리고 四加行位·十信·十住·十行·十廻向·十地·等覺·妙覺 等 諸位를 都合한 五十六位說, 等覺位를 除한 五十五說, 四加行位를 除한 五十二位 或 五十一位說, 十信位를 外凡夫位라 하야 이를 除한 四十二位 或 四十一位說 等이 有하고
且 十住·十行·十廻向을 內凡業位 或 三賢位라 云하며 十地를 十聖位라 謂하는 三賢十聖說, 初·二·三地를 三賢位, 四地를 入聖之門, 五地부터 十地까지를 六聖位라 云謂하는 三賢六聖說 等이 有하는 바 筆者는 五十五位說과 三賢六聖說을 支持하는 同時에 五十五位를 漸次한 次第漸修說을 打破하고 內의 五十位에 있어 五位十重 又는 十位五重으로 縱橫 觀擦하야 五蘊皆空을 證하는 境地료서 곧 五智如來를 成就하는 方便이라 云하오니
三界 四大의 色陰을 걷고 諸法空을 證하면 비로소 正信이 生할새 初信이오 受陰을 걷고 二無我를 證하면 初發心의 歡喜地에 住할새 初發心住요 想陰을 걷고 分別心을 除却하면 如來의 妙德으로써 十方에 隨順하야 歡喜로 行할새 初歡喜行이오 行陰을 걷고 一切에 通하면 一切衆生을 救護할새 初救護-切衆生廻向이오 識陰을 걷고 처음으로 正覺에 登하야 歡喜踊躍할새 初歡喜地며 且 加行功德으로써 初地를 成就하면 初信과 같은 信이 生하고 初住와 같은 地에 住하고 初行과 같이 行하고 初廻向과 같이 廻向하나니 餘皆 倣此할지오, 加之에 初·二地란 色陰 三·四地란 受陰 五·六地란 想陰 七·八地란 行陰 九·十地란 識陰을 걷는 等의 果位로서 加行이란 因位일새
勤策修行하야 此等 五十位를 圓滿 成就하면 곧 妙覺이라 名하니 解脫十六地란 菩薩十地를 根幹으로 하고 聲聞, 緣覺十地, 三乘共十地, 密敎十地, 瑜伽十七地, 信·住·行·廻向 等 四의 十位, 五 相成身位, 五忍, 十三觀門, 四加行i道 等을 枝葉으로 하야 顯密을 會通한지라 修者一初生三歸地하고 乃至 十六生無餘地하야 究竟 成就할지니 正히 十六生成佛說에 合하니라 (聲聞+緣覺+菩薩=解說+四地까지) 甲申夏 碧山閑人 撰
16에 무여지(無餘地)라, 열반에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이 있는데 해석이 구구합니다. 유가17지의 마지막 위인 무여의지(無餘依地)의 약칭으로서 공십지의 10. 불지(佛地)에 당하는 묘각(妙覺)의 자리니, 4각중 본각(本覺)을 제하고 16지에 안배하면 이가 구경각(究竟覺)이요, 4지까지가 상사각(相似覺), 5지부터 수분각(隨分覺)이며, 5인(忍)으로 안배하면 4지까지 복인(伏忍), 8지까지 신인(信忍), 11지까지 순인(順忍), 14지까지 무생인(無生忍), 나머지 2지가 적멸인(寂滅忍)으로서 3지까지가 하복인(下伏忍:習忍), 4가행지(四加行地) 중 명득정과 명증정이 중복인(中伏忍:性忍), 인순정(印順定)이 상복인(上伏忍:道種忍), 5, 6합지가 하신인(下信忍), 7지가 중신인(中信忍), 8지가 상신인(上信忍), 9지가 하순인(下順忍), 10지가 중순인(中順忍), 11지가 상순인(上順忍), 12지가 하무생인(下無生忍), 13지가 중무생인(中無生忍), 14지가 상무생인(上無生忍), 15지가 하적멸인(下寂滅忍), 16지가 상적멸인(上寂滅忍) 인바 이를 14인(忍)이라고도 말하고 상적멸인을 제하여 13관문(觀門)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공(空)·성(性)·상(相) 3종(宗)은 원래 횡적으로 간별할 바 아니요, 종적으로 그 정도를 각각 시설한다면 복(伏)·신(信)· 순(順) 등 3인은 상종(相宗)이요, 무생인은 성종(性宗)이며 적멸인은 공종(空宗)이니라, 그리고 4가행위(四加行位)·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등 제위를 도합한 56위설 또는 등각위를 제한 5위설 또는 4가행위를 제한 52위설 혹은 51위설 또는 십신위 (十信位)를 외범부위(外凡夫位)라 하여 이를 제한 42위설 혹은 41위설 등이 있고,
또는 십주·십행·십회향을 내범부위(外凡夫位) 혹은 삼현위(三賢位)라 하며, 십지를 십성위(十聖位)라 이르는 삼현십성설(三賢十聖說). 또는 초·2·3지를 삼현위(三賢位), 4지를 입성지문(入聖之門), 5지부터 10지까지를 육성위(六聖位)라 말하는 삼현육성설(三賢六聖說) 등이 있는데,
필자(금타 스님)는 55위설과 삼현육성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55위를 점차한 차제점수설(次第漸修說)을 타파하고 내(內)의 50위에 있어 오위십중(五位十重) 또는 십위오중(十位五重)으로 종횡 관찰하여 오온개공을 증득하는 경지로서 곧 오지여래(五智如來)를 성취하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삼계(三界) 사대(四大)의 색음(色陰)을 걷고, 우리 중생이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색 곧 물질이 있다고 하는 유병(有病)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지금 없다고 밝히는데 하물며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는 불자들이 유병에 걸리면 공부가 안됩니다. 꼭 색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법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반야바라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야지혜에 어두우면 보시(布施)도 제대로 못되고 또는 사회운동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가장 소중한 보배가 제법공(諸法空)자리를 증득하게 하고 제법공도리를 깨닫기 위한 신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법공을 증해야 비로소 정신(正信)이 생하니 초신(初信)이우 수음(受陰)을 걷고 이무아(二無我: 我空·法空)를 증(證)하면 초발심의 환희지에 머무를새 초발심주(初發心住), 상음(想陰)을 걷고 분별심을 없애버리면 여래의 묘덕으로써 시방에 수순하여 환희로 행할새 초환희행(初歡喜行)이요, 행음(行陰)을 걷고 일체에 통하면 일체 중생을 구호할새 초구호일 체중생회향(初救護一切衆生廻向)이요, 식음(識陰)을 걷고 처음으로 정각(正覺)에 등(登)하여 환희용약할새 초환희지(初歡喜地)며 또는 가행공덕으로써 초지(初地)를 성취하면 초신(初信)과 같은 신이 생하고 초주(初住)와 같은 지에 주하고 초행(初行)과 같이 행하고, 초회향(初廻向)과 같이 회향하나니, 나머지는 다 이와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초·2지란 색음(色陰), 3·4지란 수음(受陰), 5·6지란 상음(想陰), 7·8지란 행음(行陰), 9·10지란 식음(識陰)을 걷는 등의 과위(果位)로서, 가행(加行)이란 인위(因位)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러한 50위를 원만성취하면 곧 묘각(妙覺)이라 이름하니 해탈십육지란 보살십지를 근간으로 하고 성문십지, 연각십지, 삼승공십지, 밀교십지, 유가십칠지, 신(信)·주(住)·행(行)·회향(廻向) 등 넷의 10위,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 오인(五忍), 십삼관문(十三觀門), 사가행(四加行) 등을 지엽으로 하여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를 회통(會通)한지라, 수행자는 처음에 삼보에 귀의하고 점차 수행하여 16무여지(無餘地)에 이르러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성취하는 것이니 바로 십육생성불설(十六生成佛說)에 합당합니다.
제4절 수도(修道)의 위차(位次)
다음은 수도(修道)의 위차(位次)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타 스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금강심론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금강심론에 미처 안 나와 있는 것도 각 경론에서 인용하여 한 체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엄경(華嚴經)의 보살십지(菩薩十地)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유식(唯識)의 십바라밀(十波羅蜜) 또는 수릉엄경(首楞嚴經)의 오십육위사만성불위 (五十六位四滿成佛位), 그 다음에 금강심론의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 또 인왕경(仁王經) 교화품에 있는 오인십삼관문(五忍十三觀門), 또는 지도론(智度論)에 있는 구차제정(九次第定), 그 다음에 유가론의 유가십칠지(瑜伽十七地), 그 다음에 지도론에 있는 삼승공십지(三乘共十地), 그리고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에 있는 성문십지(聲聞十地), 연각십지(緣覺十地), 또는 보리심론(菩提心論)에 있는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입니다. 보리심론은 용수보살이 저술한 논장입니다. 다음에 유식론에 있는 유식오위(唯識五位), 천태 대사 지관론(止觀論)에 있는 육즉(六卽), 구사론(俱舍論)에 있는 사도(四道), 비장보론(秘藏寶論)의 십주심(十住心), 비장보론을 지은 분은 일본의 공해(弘法空海 774∼835 日本 眞言宗의 開祖)꼴 대사입니다. 또 십우도서(十牛圖序)는 중국의 확암지원(廓庵志遠)선사의 창설이라 하며 다른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성불하는 계위를 한 체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선으로 갈라놓았는데 두 선 위에는 욕계(欲界) 곧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위(凡夫位)이고 그 아래는 깨달은 성자친(聖者位)입니다. 성자(聖者)나 현자(賢者)에 대해서도 경론에 따라 달리 표현하여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진여불성(眞如佛性)을 증득(證得)함을 기준하여 성자(聖者)라 표현하였습니다.
맨 나중에 십주심(十住心)과 십우도서(十牛圖序)는 그런 계위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보살십지(菩薩十地)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경론을 근거로 하여 대비회통(對比會通)한 수행(修行)과 수도(修道)의 위차(位次)입니다.
★ page 545. 546. 도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
제5절 삼계 해탈(三界解脫)
1. 삼계(三界)
凡夫가 生死往來하는 世界를 三에 分하니
一에 欲界란 淫欲과 食欲을 主로 하고 諸說을 從으로 한 有情의 世界로서 上은 六欲天으로부터 中은 人界의 四大洲를 經하야 下는 無間地獄에 至하기까지를 云함이오
二에 色界란 色은 質碍의 義으로서 有形의 物質을 云함이니 此 界는 欲界의 上에 在하야 淫·食 二欲을 主로 한 諸欲을 離한 有情의
世界로서 身體나 依處나 物質的 物은 總히 殊妙精好할새니 此 色界를 禪定의 淺深鹿妙에 由하야 四級의 四禪天이라 或은 靜慮라 云하고 此中에서 或은 十六天을 立하며 或은 十七天을 立하며 或은 十八天을 立함이오
三에 無色界란 物質的의 色이 都無할새 身體나 依處가 無하고 오직 心識으로써 深妙한 禪定에 住할 따름이라 다만 果報가 色界보다 勝한 義에 就하야 其 上에 在하다심이니 此에 亦是 四天이 有하야 或은 四無色이라 四空處라 云하는 바
要컨대 三界란 色陰을 銷却하는 三品의 程度를 示한 者로서 枝末無明인 六境이 欲界요 根本無明인 六根이 色界요 受·想·行·識의 染識인 六識이 無色界라 六境·六根·六識의 十八天으로 色界를 無色界까지 延長함이 法合하니 鹿大한 欲界와 細微한 無色界는 色界에 立脚한 禪定으로써 分明히 自證劉定할지오 同時에 欲界의 四大的假想인 六境이 虛妄不實함을 信忍한 四善根이 信位에서 그의 實相을 證하고 此 地에 住하야 解行一如로써 受·想·行·識 四陰의 滅盡에 따라 常·樂·我·淨을 成就할새 名이 四滿成佛의 妙覺인 바 解悟에 있언 一念에 三界를 超越할 수 있으나 證隆에 있언 界分이 本有하니 三界를 圖示하면 如左하니라
저번에 삼계(三界)를 도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삼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를 셋으로 나누니 1. 욕계(欲界)란 음욕과 식욕을 주로 하고 모든 제반 욕심을 종으로 한, 보통은 욕계 삼욕(三欲)이라고 해서 음욕, 식욕, 잠(수면)욕으로 말합니다.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위는 6욕천(六欲天)으로부터 중(中)은 우리 인간의 사대주(四大洲)를 거쳐서 하(下)는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를 욕계라고 하며,
2. 색계(色界)란 색은 질애(質碍)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술어로 하면 질료라고 말합니다. 유형의 물질을 말함이니 이 세계는 욕계의 위에 있어서 음욕이나 식욕이나 잠욕이나 그런 욕심을 주로 한 모든 욕망을 떠난 유정의 세계로서 신체(身體)나 의처(依唜)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물(物)은 모두 다 수묘정호(殊妙精好)할새니,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물질이 아니라 이른바 광명세계(光明世界)를 말합니다. 색계에 올라가면 벌써 자기 몸도 주변도 모두 다 광명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세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하등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근원에는 하나의 광량자(光量子) 즉 가장 미세한 광자(光子)라 하는 것이 파도처럼 우주에 충만하여 우주의 장(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광명의 파동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빛으로 색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색계의 선정(禪定)이 옅고 깊고 또는 거칠고 묘한 정도에 따라서 4급의 사선천(四禪天)이라 혹은 사정려(四靜慮)라 말하고 이중에는 혹은 16천을 세우고, 혹은 17천을 세우며, 혹은 18천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욕계와 무색계는 고정적으로 욕계 6욕천 무색계 4천을 말하는데 색계는 16천이라 하는데도 있고 17천이라 하기도 하고 18천이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19천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3. 무색계(無色界)란 물질적인 색이 조금도 없으며 신체나 의지하는 환경도 없고 오직 심식(心으로써 심묘(深妙)한 선정에 머물 따름인데. 다만 그 과보가 색계보다 더 수승한 곧 업장이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다 하심이니, 이것에 역시 4천(四天)이 있어서 혹은 4무색(四無色)이라, 4공처(四空處)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3계란, 색음을 곧 번뇌의 어두움을 다 녹여서 없애는 3품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서 지말(校末)무명 곧 거칠은 번뇌인 6경(境)이 욕계요, 근본무명인 6근(根)이 색계요. 수와 상과 행과 식의 염식(染識)인 6식(識)이 무색계라. 6경·6근·6식의 18천으로 색계를 무색계까지 연장함이 법에 합하니, 6경, 6근, 6식이면 3×6은 18입니다.
추대(大)한 욕계, 본래 근(根)은 색계인데 욕계는 추대(鹿大)해서 업장 때문에 퍼뜨려져서 되었습니다. 또는 보다 더 정밀한 무색계는 색계에 입각한 선정으로써 분명히 스스로 증명해서 한계를 밝혀야 할 것이요, 동시에 욕계의 사대적(四大的) 가상(假相)인 6경 (境)이 허망부실함을 신인(信忍)한 사선근(四善根)이,
따라서 우리가 일심 정념으로 가행정진하는 것은 욕계외 모든 경계가 허망부실하다는 것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못 믿으면 4선근이 못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역시 욕계의 6경이 허망부실한 것을 깊게 못 믿으면 아직 공부는 미숙한 것입니다. 4선근이 미처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분은 자기 점검을 잘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몸뚱이도 허망하고 감투도 재물도 허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확신되어서 실제로 확립이 되어야 이른바 4선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위(身位)에서 그의 실상을 증명하고 이 경지에 머물러서 해(解)와 행(行)의 일여(一如)로써 수·상·행·식 4온(四蘊)의 번뇌가 소멸됨에 따라 상락아정(常樂我淨) 곧 상주부동하여 영생하는 상(常)과, 무한의 행복인 안락(樂)과, 삼명육통을 다하고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아(我)와, 또는 번뇌가 흔적도 없는 정(淨)이 열반사덕(涅槃四德)인 상락아정이며 우리 자성공덕(自性功德)입니다. 자성공덕을 항시 마음에다 두어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해서 영생하고, 한량없이 안락해서 일체 행복을 원만히 다 구족하고, 신통자재해서 모든 지혜공덕을 다 갖추고, 청청 무구해서 조금도 번뇌의 때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비로소 상실된 자기 고향,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자아의 회복, 상실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얄팍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오한 상락아정의 무량공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성은 깊고도 묘하고 공덕원만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성의 존엄을 말하는 것은 이 존엄성이 다른 것과 비교 할 수가 없으니까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뭘 좀 알고, 자유를 좀 구하고, 그런 정도로 존엄스럽다고 하면 그것은 존엄한 인간성의 모독입니다.
상락아정을 성취할새 이름이 사만성불(四滿成佛)이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원만입니다. 믿음으로 원만, 해석으로 원만 또는 행으로 원만, 증명으로 원만 입니다. 이러한 사만성불이 묘각(妙覺)인 바 해오(解悟)에 있어서는 일념(一念)제 삼계를 초월할 수 있으나 증오(證悟)에는, 증명하는 깨달음에는 계분(界分) 곧 자기 업장의 소멸에 따른 차서가 본래 있는 것이니 삼계를 도시(圖示)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5절 삼계 해탈(三界解脫)
1. 삼계(三界)
凡夫가 生死往來하는 世界를 三에 分하니
一에 欲界란 淫欲과 食欲을 主로 하고 諸說을 從으로 한 有情의 世界로서 上은 六欲天으로부터 中은 人界의 四大洲를 經하야 下는 無間地獄에 至하기까지를 云함이오
二에 色界란 色은 質碍의 義으로서 有形의 物質을 云함이니 此 界는 欲界의 上에 在하야 淫·食 二欲을 主로 한 諸欲을 離한 有情의
世界로서 身體나 依處나 物質的 物은 總히 殊妙精好할새니 此 色界를 禪定의 淺深鹿妙에 由하야 四級의 四禪天이라 或은 靜慮라 云하고 此中에서 或은 十六天을 立하며 或은 十七天을 立하며 或은 十八天을 立함이오
三에 無色界란 物質的의 色이 都無할새 身體나 依處가 無하고 오직 心識으로써 深妙한 禪定에 住할 따름이라 다만 果報가 色界보다 勝한 義에 就하야 其 上에 在하다심이니 此에 亦是 四天이 有하야 或은 四無色이라 四空處라 云하는 바
要컨대 三界란 色陰을 銷却하는 三品의 程度를 示한 者로서 枝末無明인 六境이 欲界요 根本無明인 六根이 色界요 受·想·行·識의 染識인 六識이 無色界라 六境·六根·六識의 十八天으로 色界를 無色界까지 延長함이 法合하니 鹿大한 欲界와 細微한 無色界는 色界에 立脚한 禪定으로써 分明히 自證劉定할지오 同時에 欲界의 四大的假想인 六境이 虛妄不實함을 信忍한 四善根이 信位에서 그의 實相을 證하고 此 地에 住하야 解行一如로써 受·想·行·識 四陰의 滅盡에 따라 常·樂·我·淨을 成就할새 名이 四滿成佛의 妙覺인 바 解悟에 있언 一念에 三界를 超越할 수 있으나 證隆에 있언 界分이 本有하니 三界를 圖示하면 如左하니라
저번에 삼계(三界)를 도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삼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를 셋으로 나누니 1. 욕계(欲界)란 음욕과 식욕을 주로 하고 모든 제반 욕심을 종으로 한, 보통은 욕계 삼욕(三欲)이라고 해서 음욕, 식욕, 잠(수면)욕으로 말합니다. 유정(有情)의 세계로서, 위는 6욕천(六欲天)으로부터 중(中)은 우리 인간의 사대주(四大洲)를 거쳐서 하(下)는 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를 욕계라고 하며,
2. 색계(色界)란 색은 질애(質碍)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술어로 하면 질료라고 말합니다. 유형의 물질을 말함이니 이 세계는 욕계의 위에 있어서 음욕이나 식욕이나 잠욕이나 그런 욕심을 주로 한 모든 욕망을 떠난 유정의 세계로서 신체(身體)나 의처(依唜)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물(物)은 모두 다 수묘정호(殊妙精好)할새니,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물질이 아니라 이른바 광명세계(光明世界)를 말합니다. 색계에 올라가면 벌써 자기 몸도 주변도 모두 다 광명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세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하등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근원에는 하나의 광량자(光量子) 즉 가장 미세한 광자(光子)라 하는 것이 파도처럼 우주에 충만하여 우주의 장(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광명의 파동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미묘한 빛으로 색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색계의 선정(禪定)이 옅고 깊고 또는 거칠고 묘한 정도에 따라서 4급의 사선천(四禪天)이라 혹은 사정려(四靜慮)라 말하고 이중에는 혹은 16천을 세우고, 혹은 17천을 세우며, 혹은 18천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욕계와 무색계는 고정적으로 욕계 6욕천 무색계 4천을 말하는데 색계는 16천이라 하는데도 있고 17천이라 하기도 하고 18천이라 하는 데도 있고 또는 19천을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3. 무색계(無色界)란 물질적인 색이 조금도 없으며 신체나 의지하는 환경도 없고 오직 심식(心으로써 심묘(深妙)한 선정에 머물 따름인데. 다만 그 과보가 색계보다 더 수승한 곧 업장이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그 위에 있다 하심이니, 이것에 역시 4천(四天)이 있어서 혹은 4무색(四無色)이라, 4공처(四空處)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3계란, 색음을 곧 번뇌의 어두움을 다 녹여서 없애는 3품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서 지말(校末)무명 곧 거칠은 번뇌인 6경(境)이 욕계요, 근본무명인 6근(根)이 색계요. 수와 상과 행과 식의 염식(染識)인 6식(識)이 무색계라. 6경·6근·6식의 18천으로 색계를 무색계까지 연장함이 법에 합하니, 6경, 6근, 6식이면 3×6은 18입니다.
추대(大)한 욕계, 본래 근(根)은 색계인데 욕계는 추대(鹿大)해서 업장 때문에 퍼뜨려져서 되었습니다. 또는 보다 더 정밀한 무색계는 색계에 입각한 선정으로써 분명히 스스로 증명해서 한계를 밝혀야 할 것이요, 동시에 욕계의 사대적(四大的) 가상(假相)인 6경 (境)이 허망부실함을 신인(信忍)한 사선근(四善根)이,
따라서 우리가 일심 정념으로 가행정진하는 것은 욕계외 모든 경계가 허망부실하다는 것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못 믿으면 4선근이 못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역시 욕계의 6경이 허망부실한 것을 깊게 못 믿으면 아직 공부는 미숙한 것입니다. 4선근이 미처 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분은 자기 점검을 잘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몸뚱이도 허망하고 감투도 재물도 허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확신되어서 실제로 확립이 되어야 이른바 4선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위(身位)에서 그의 실상을 증명하고 이 경지에 머물러서 해(解)와 행(行)의 일여(一如)로써 수·상·행·식 4온(四蘊)의 번뇌가 소멸됨에 따라 상락아정(常樂我淨) 곧 상주부동하여 영생하는 상(常)과, 무한의 행복인 안락(樂)과, 삼명육통을 다하고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아(我)와, 또는 번뇌가 흔적도 없는 정(淨)이 열반사덕(涅槃四德)인 상락아정이며 우리 자성공덕(自性功德)입니다. 자성공덕을 항시 마음에다 두어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해서 영생하고, 한량없이 안락해서 일체 행복을 원만히 다 구족하고, 신통자재해서 모든 지혜공덕을 다 갖추고, 청청 무구해서 조금도 번뇌의 때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비로소 상실된 자기 고향,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자아의 회복, 상실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얄팍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오한 상락아정의 무량공덕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성은 깊고도 묘하고 공덕원만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성의 존엄을 말하는 것은 이 존엄성이 다른 것과 비교 할 수가 없으니까 존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뭘 좀 알고, 자유를 좀 구하고, 그런 정도로 존엄스럽다고 하면 그것은 존엄한 인간성의 모독입니다.
상락아정을 성취할새 이름이 사만성불(四滿成佛)이라,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원만입니다. 믿음으로 원만, 해석으로 원만 또는 행으로 원만, 증명으로 원만 입니다. 이러한 사만성불이 묘각(妙覺)인 바 해오(解悟)에 있어서는 일념(一念)제 삼계를 초월할 수 있으나 증오(證悟)에는, 증명하는 깨달음에는 계분(界分) 곧 자기 업장의 소멸에 따른 차서가 본래 있는 것이니 삼계를 도시(圖示)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2. 사선정 (四禪定)
前의 四善根이란 곧 地·水·火·風 四大의 淦界인 色蘊을 打成一하는 境界요
四禪定이란 密界의 그 實色을 證見하는 同時에 受·想·行·識 四蘊의 四禪으로써 常·樂·我·淨 四德의 四定에 轉入하는 境界니 곧 四無色의 境界一相을 觀察함은 四禪이오 그의 思惟로써 一行함은 四定이라
空無邊處를 觀하고 念하야 色界의 金塵相을 見하고 欲界의 虛妄相을 一掃한 涅槃界의 淨德을 證함은 初禪定이오
識無邊唜를 觀하고 念하야 微塵의 阿★550아래서 둘째줄★色을 見하는 同時에 水性的 受陰을 걷고 淨心의 我德을 證함은 二禪定이오 無所有處를 觀하고 念하야 色究竟의 極微相을 見하는 同時에 火性的 想陰을 轉하야 一道光明의 常德을 證함은 三禪定이오
非想非非想處를 觀하고 念하야 微微의 隣虛相을 見하는 同時에 風性的 行陰을 轉하야 樂德을 證함은 四禪定일새 四禪定이란 곧 姿姿卽 寂光土임을 見하고 娑婆世界 그대로 極樂世界임을 證함이니라
그리하야 欲界의 惑網을 超脫하고 色界에 生할새 諸功德을 生하는 依地根本이 되는지라 四禪定을 本禪이라고도 稱하니 身에 動·痒·輕·重·冷·煖·澁·滑의 八觸이 生하고 心에 空·明·定·智·善心·柔軟·喜·樂·解脫·境界相應의 十功德이 生함은 初禪定에 入한 證相이며 初禪부터 鼻·舌 二識이 無하고 二禪부턴 五識을 모두 離하고 다만 意識만 有하니 或은 眼·耳· 身 三識의 喜受가 有하야 意識과 相應하고 意識의 樂受가 有하야 三識과 相應하는 바 意識의 喜悅이 鹿大할새 喜受요 樂受가 않이로되 三禪엔 亦是 意識만이 有하야 樂·捨 二受가 相應하되 怡悅의 相이 至極淨妙할새 樂受며 四禪엔 亦是 意識뿐이오 오직 捨受와 相應할 뿐이니라
그리고 相에 있어 四禪에 각각 三級씩 有하고 性에 있어 四級 乃至 八級을 言하는 바 天이란 密界의 地相으로서 色界 十二天에 無色界의 淨梵地를 加하야 色界라 總稱함도 有하니 곧 禪定의 次序니라
그런데 四大의 實色인 줄 是認할 뿐이오 四大의 虛相을 離한 實相임을 感得못함은 凡夫의 所見일새요 四陰을 四德으로 轉換못함은 外道의 淺見일새 다만 根機에 있을 따름이오 三界에 있지 않음을 了知하는 同時에 四禪定을 外道禪이라 貶하고 近來의 死禪 곧 無誰定이나 妄想定인 邪定의 修行을 能事로 自認하는 啞羊僧을 警戒하노라. 四禪定이란 三乘聖者의 共修하는 根本禪임을 再吟味하기 바라며 滅盡定을 거쳐 究竟成統할지니라.
이 사선정(四禪定)은 앞에서 대강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근본선(根本禪)으로서 모든 선정의 근본이 되며 증오(證悟)를 위한 필수(必須)적인 선법(禪法)입니다. 금강심론에 한결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합시다.
앞의 사선근(四善根)이란 곧 지·수·화·풍 4대(四大)의 현계(顯界) 곧 나타나 있는, 우리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대 유한적인 세계라는 말입니다. 현계의 반대가 밀계(密界)입니다. 색온(色蘊)을 타성일편(打成一片)하는 경계요 곧, 모두를 하나의 공상(空相)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선근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물질이요 내 몸뚱이요, 이런 것들을 처부셔 공상(空相)으로 통찰하지 못하면은 4선근은 못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한 말로 말하면 4대 색온이 다 비었다고 달관(達觀)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까지 포함하여 천지 우주의 모든, 있는 것이 다 비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본래로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해 나가면 차근차근 비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비어지면 참선이 잘못 되는 것이지요. 원래가 빈 것인데 안 비어질 까닭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욕심이나 분노심이 점차로 줄어가고 상(相)이 가셔가겠죠, 상이라는 것은 내나 무엇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요, 있다고 집착해서 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인가? 수·상·행·식(受想行識)인 우리 마음에 오염되어 있는 습기(習氣)를 없애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은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대 유한적인 것이 모두 다 비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스며 있는 오염(汚染)을 차근차근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경(佛經)의 근본 요지는 다 그런 뜻입니다. 근본불교에는, '네 몸뚱이가 비었다'고 가르치면 소중히 아끼는 자기 몸뚱이 인데 상식 밖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12년 동안이나 중생 근기에 따라 가르쳐가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대가 바로 비었느니라, 그대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고 그대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잠시 구성되어 있으니 본래로 다 비었느니라' 하고 일체가 다 비었다는 제법공(諸法空) 도리를 또한 22년 동안이나 말씀했던 것입니다. 공.(空)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기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제법공 도리, 반야(般若)의 지혜가 없으면 참선도 못되고 불교도 아닙니다. 염불(念佛)도 제법공 자리에 입각해야지 그렇게 못하면 하나의 방판에 불과합니다. 극락세계가 십만억 국토 저 밖에 가 있다 하면 친지 우주가 다 비었는데 어디 밖이 있고 안이 있습니까? 천지 우주는 이대로 극락세계요, 이대로 광명세계입니다. 극락세계의 별명이 광명세계요, 화장(華藏) 세계입니다. 화장세계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춘 찬란 무변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영생불멸의 세계가 연화장(蓮華藏)세계이고 극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實存)적 세계인데 우리 중생의 업장으로 물질이라는 환상에 얽매여서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하는 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을 떼어버리면 본래 극락세계인지라 극락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 사바세계가 곧 적광토(寂光土)라, 사바세계를 떠나서 저 밖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도 떠나지 않고 바로 내 몸 이대로 부처요, 이 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못 보는 데에 허물이 있는 것이지, 극락세계와 사바세계, 예토(穢土)와 정토(淨土)가 따로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절박한 시대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여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교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한결같이 실상(實相)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타성일편(打成一片)이란 말을 거듭 역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체 만법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한 인생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래로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려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래저래 막히고 거리끼면 자기 마음도 항시 의단이 풀리지 않고 마음의 흐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불성(佛性)이요, 불성이 아닌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질이란 환상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진여불성(眞如佛性)만 남지 않겠습니까?
사선정(四禪定)이란 밀계(密界)의 그 실색(實色)을 증명해서 보는 동시에 수·생·행·식 4온(蘊)의 4선(禪)으로써 상·락·아·정 4덕(四德)의 4정(定)에 전입(轉入)하는 경계이니 곧 4무색(無色)의 경계일상(境界一相)을 관찰함은 4선(禪)이요, 그의 사유(思惟)로써 일행(一行)함은 4정(定)입니다.
공무변처(空無邊處)를 관(觀)하고 념(念)하여 색계의 금진상(金塵相)을 견(見)하고, 금진상을 견해야 금강지입니다.
관법(觀法)을 관법 외도(外道)라고 폄(貶)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도 관법이요 6조 스님까지 한결같이 관법인데 관법이 외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미숙한 풍토입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법집(法執), 불경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아무렇게나 국집하는 그런 법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함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다 관법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관조(觀照)하는 수행법 속에 모든 수행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계의 허망상을 없애고 열반계의 정덕(淨德)을 증험하는 것이 초선정(初禪定)입니다.
식무변처(識無邊處)를 관하고 념하여 미진(微塵)의 아누색(阿縟色)을 견(見)하는 동시에 수성(水性)적 수음(受陰) 곧 감수(感受)해서 얻은 번뇌를 걷고 청청한 마음의 아덕(我德)을 증(證)함은 2선정(二禪定)이요
무소유처(無所有處)를 관하고 념하여 색구경(色究竟)의 극미상(極微相)을 견(見)하는 동시에 화성(火性)적 상음(想陰)을 전(轉)하여 일도광명(一道光明)의 상덕(常德)을 증(證)함은 3선정(三禪定)입니다. 사바세계가 오로지 광명뿐인 광명정토, 광명세계로서 그런 광명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해 있으니까 상덕입니다.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를 관하고 념하여 미미의 인허상(隣虛相)을 견(見)하는 동시에 풍성(風性)적 행음(行陰)을 전하여 락(樂)덕을 증함은 4선정(四禪定)일새 4선정이란 곧 사바세계 즉 적광토(寂光土)임을 견(見)하고 사바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임을 증험하는 선정입니다.
그리하여 욕계의 혹망(惑網) 곧 욕계의 번뇌의 그물을 초탈하고 색계에 생할새 모든 공덕을 생하는 의지(依地) 근본이 되는지라, 욕계의 욕심 뿌리가 뽑혀 버려야 공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을 하고 싶고 뭣인가 남을 위하여 애쓰고, 알려고 하지만 욕계를 못 떠나면 안됩니다.
사선정(四禪定)을 본선(本禪)이라고도 칭하니 몸에는, 욕계를 떠나갈 때에는 동·양·경·중·냉 ·난·삽·활(動痒輕重冷煖澁滑)이라, 몸이 움직이고, 또는 가렵고, 더러는 몸이 가볍거나, 무겁고, 더러는 몸이 차고, 따습고, 더러는 깔깔하고, 또는 윤택이 있고 부드럽고 이러한 팔촉(八觸)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는 텅 다 비어서 공(空)이라, 맑아서 명(明)이요 또는 마음이 일심지(一心支)가 되어서 하나로 통일되니까 정(定)이요, 지혜가 밝아지니까 지(智)요, 또는 선심(善心)이라, 굉장히 마음이 선량해져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때문에 남을 성가시게 한다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한다거나 자기만 잘 산다든가 할 수 없는 이른바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저절로 우러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유연(柔軟)이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강강한 마음이 가시어 누구와도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같은 마음이요 같은 몸이거니 누구와 싸우고 필요 없는 시비를 하겠습니까? 희(喜)라, 기쁘고 락(樂)이라, 즐거움이고 또는 해탈(解脫)이고, 경계상응(境界相應)이라, 경계에 따라 이해가 되고 알맞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십공덕(十功德)이 생함은 초선정에 들어간 증상이며,
초선부터 비·설(鼻舌) 2식(二識)이 없어서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오관(五官)을 떠나게 됩니다.
2선부터는 5식(五識)을 모두 떠나서 몸으로 촉감도 못 느끼고 눈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인이나 4선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듣고 보고 할 것인가? 이런 때는 차기(借起)라, 하고 싶으면 짐짓 욕계의 이근(耳根)이나 또는 안근(眼根)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식(意識)만 있는 것이니 혹은 안·이·신 3식, 눈과 귀와 또는 촉감과 3식의 희수(喜受)가 있어서 의식과 상응하고 혹은 의식의 락수(樂受)가 있어서 3식과 상응하는 바 의식의 기쁨이 거치르니 희수(喜受)요, 락수(樂受)가 아닙니다.
3선에는 역시 의식만 있어서 락수(樂受)와 사수(捨受) 즉, 즐겁게 느끼고 괴롭게 느끼는 등 고락을 못 느끼는 2수(受)가 상응하되 기쁨이 지극히 맑고 미묘하니 락수(樂受)며, 4선에서는 역시 의식 뿐이요,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相)에 있어 4선에 각각 3급씩, 초선정에 3, 또 2선에 3, 또는 3선에 3, 4선에 3급이 있습니다. 성(性)에 있어서 4급 내지 8급을 말하는 바, 천(天)이란 밀계(密界)의 지상(地相)으로서 이른바 광명세계의 지상으로서 색계 12천에 무색계의 정범지(淨梵地)를 보태서 색계라 총칭하기도 하니 곧 선정(禪定)의 차서(次序)입니다.
우리가 4선천(四禪天)과 4선정(四禪定)도 구분해야겠습니다. 4선천을 선정과 덕을 닦은 과보로써 그 하늘에 태어나 안락한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고 4선정은 범부 중생이 선정을 닦아서 번뇌를 녹임에 따라 발현되는 공덕상입니다.
그런데, 사대(四大)의 실색(實色)인 줄 시인할 뿐이요. 4대의 허상을 떠난 실상(實相)임을 감득 못함은 범부 소견이요, 중생은 4대의 실색을 못 보니까 무슨 색이라 하면 중생의 차원에서 이것도 번뇌에 때묻은 색이 아닌가 하지만 묘색(妙色)은 제법이 공(空)한 자리에 나타나는 우주에 충만한 청정적광(淸淨寂光), 정광(淨光)으로서 한계나 국한이 없습니다.
또는 사음(四陰) 곧 수·상·행·식인 우리 심리에 묻어 있는 오염된 번뇌인 4음을 사덕(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으로 전환 못함은 외도의 천견(淺見)일새, 외도는 습기를 소멸하지 못하여 나라는 아(我)를 못 끊는 것입니다. 외도와 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도는 아(我)를 끊는 것이고 외도는 아를 못 끊는 것입니다. 멸진정(滅盡定)을 성취해야 수와 상과 행과 식에 있는 마지막 아(我)의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이므로 정도(正道)라 합니다.
다만 근기(根機)에 있을 따름이요 삼계에 있지 않음을 요지(了知)하는 동시에, 삼계란 깨달은 안목에서는 오직 청청무비한 영원한 극락세계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보아서 또는 업
장 따라서 오염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선정을 외도선(外道禪)이라 폄(貶)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근본선(根本禪)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선(死禪) 곧 죽은 선인, 바른 지혜없이 멍청히 닦는 무기정(無記定)이나, 근본 성품을 여의고 분별하고 헤아리며 닦는 망상정(妄想定)인 삿된 사정(邪定)을 닦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두들고, 염불하고, 주문 외우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아님이 없고 천지 우주는 진여불성의 청정미묘한 무량적광으로 충만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느끼고 그 자리를 안 여의고 닦아야지 그렇지 않고 분별하고 헤아리면 결국은 망상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무슨 상대유한적인 문제를 의심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망상 아닙니까? 일체가 부처라는 생각 외에 한 생각이라도 달리 일어나면 벌써 다 망(妄)이라는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청정미묘하고 일미평등한 불성뿐이다 는 생각 외에는 사실은 다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사 어록에 일념불생(一念不生)이라, 한 생각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정(邪定)의 수행을 능사로 자인하는 아양승(啞羊僧) 곧 참다운 진리를 모르고서 법을 잘못 설하는 승(僧)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선정이란 삼승성자(三乘聖者)가 공수(共修)하는, 누구나 함께 닦아야 하는 근본선(根本禪)입니다. 4선정을 이른바 근본선이라고 합니다. 근본불교의 요체는 근본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이나 버어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출가승의 자세는 좋은데 정작 수행법에 있어서는 근본선을 제대로 닦지 않는 것입니다. 참다운 비파사나(Vipasyana)는 근본선을 닦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비파사나 선을 공부하는 분도 꼭 근본선을 닦아야 부처님 당시의 아함경, 근본불교의 요체를 공부하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선은 소승권이나 대승권이나 누구나 다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번뇌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고 더디 가는 차이뿐인 것이지 꼭 근본선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타 스님도 근본선을 역설하여 재음미하기 바라며 멸진정(滅盡定)을 거쳐 구경성취(究竟成就)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선정이 구경지(究竟地)는 아닙니다. 외도와 정도가 공수(共修)하기 때문에 외도도 4선정을 닦으나 다만 아(我)를 못 떼고 머물러 버리고, 정도는 아(我)를 소멸한다는 견고부동한 대원력(大願力)으로 멸진정(滅盡定)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3. 멸진정(滅盡定)
「大乘義章」 二에 「滅盡定者는 謂諸聖人이 患心勞慮하야 暫滅心識 함이니 得一有爲의 非色心法하야 領補心處함을 名 滅盡定」이랐고 同九에 「滅受想者는 偏對受想二陰하야 彰名함이라 想絶受亡이 名 滅受想이오 滅盡定者는 通對一切의 一心心數法하야 以彰名也니 心及心法의 一切俱亡이 名爲滅盡」이랐으며 「俱舍論」 五에 如說컨대 「復有別法하니 能令心心所로 滅함을 名無想定이오 如是히 復有別法하니 能令心心所로 滅함일새 名滅盡定」이랐고 同述記 七本에 「彼心心所의 滅을 名滅定이오 恒行인 染汚의 心 等이 滅故로 卽此亦名 滅受想定이라」하야 滅盡定을 滅受想定이라고도 名하고 六識의 心心所를 滅盡하는 禪定의 名으로서 그 加行方便에 特히 受의 心所와_想의 心所를 厭忌하야 此를 滅함일새 加行에 從한 滅受想定이오 不還果 以上의 聖者가 漫槃에 假入하는 想을 起하야 此의 定에 入함일새 極長이 七日이라 滅盡定인 양 解하나
換言하면 滅盡定이란 色陰을 滅盡함에 따라 受·想·行·識 四陰의 染心을 滅盡하는 三昧의 名이니 初·二地에서 色陰을 三·四地에서 受陰을 五·六地에서 想陰을 七·八地에서 行陰을 九·十地에서 識陰을 上下品의 十重 五位로 滅盡함이오 또는 十信位에서 色陰을 十住位에서 受陰을 十行位에서 想陰을 十廻向位에서 行陰을 十地位에서 識陰을 五重 十位로 滅盡함이니 十重 五位론 十住位부터 五重 十位론 三地부터 次第로 滅盡함이니라
곧 先修後證과 先證街繼의 別은 姑捨하고 色蘊 又는 此에 染汚한 四蘊의 染心을 滅盡하고 淨心에 住하야 常樂의 一大人我를 成就하는 滅盡三昧의 名아니라
그리하야 四禪·四定에 此를 加하고 九次第定이라 稱하는 바 四禪·四定은 三乘聖者와 外道가 共修하나 第九의 滅盡定은 聖者에 限하는 同時에 外道는 法相에만 限하고 正道에 不在하며 根機에 따라 次第漸修 又는 間超와 頓超의 別이 有하니라
대승의장(大乘義章) 2에 '멸진정자(滅盡定者)는 위제성인(謂諸聖人)이 환심노려(患心勞慮)하여' 자기라는 관념을 떼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라는 관념인 아상(我相)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심노려하여, 자기란 허망한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고 애써서, '잠멸심식(暫滅心識)함이니' 잠시 동안 심식(心識)을 멸함이니, 완전히 멸하면 또 안되겠죠. 그러면 죽은 사람, 그때는 무기(無記)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시비가 다 끊어져버린, 분별심 없는 선정이 무심정(無心定)인데, 무심정은 외도가 닦는 무상정(無想定)과 정도가 닦는 멸진정(滅盡定)으로서 모두 다 4선정을 성취해야 들어가는 것인데 무상정은 외도들이 무상천의 과보를 얻기 위해서 닦기 때문에 생각이 멸하여지면 이것이 열반이라고 집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상정이고 정도는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번뇌습기를 소멸하기 위하여 잠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 제도의 원력 때문에 장시간(長時間)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승은 벌써 보살 아닙니까? 이 몸뚱이를 천만 개를 다 없애더라도 범부 중생을 모조리 바른 도리로 이끌어야겠다는 서원 때문에 보살은 오랫동안 선정락에 잠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는 찌꺼기만 없애기 위해서 잠시 동안 마음을 끊어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위(有爲)의 비색심법(非色心法)을 득(得)하여 심처(心處)를 보령(補領)함을 멸진정이라 이름하였다' 고 하였고 대승의장 9에는 '멸수상(滅受想)이란 것은 수(受)와 상(想)의 2음(陰)에 대하여 이름을 나타낸 것인데, 의식으로 감수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은 다 번뇌이니 상상한 것이 끊어지고 또 감수한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멸수상이요 또한 멸진정
은 일체의 모든 가지가지의 마음법에 대하여 이름을 나타낸 것이니 심왕법(心王法)과 심소유법(心所有法)으로서, 심(心)은 아뢰야식으로서 마음의 주체인 심왕(心王)이고 심소유법(心所有法)은 주체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법인데 이런, 심급심법(心及心法) 일체가 없어지는 것을 이름하여 멸진(滅盡)이라' 하였으며,
구사론(俱舍論) 5에 또 말씀하시되 '다시 별법(別法)이 있으니 능히 심법과 심소유법을 멸함을 명무상정(明無想定)이라 하고 또한 다른 법이 있는데 능히 심법과 심소유법을 멸함을 명멸진정(名滅盡定)이라' 하였고,
동술기(同述記) 7본에 '피심심소(彼心心所) 곧 심왕(心王)과 심소유법을 멸함은 멸정(滅定)이요 항시 업을 짓는 염오(染汚)된 마음이 멸하니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 하여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고도 이름하고 6식(識)의 심심소(心心所)를 멸진하는 선정의 이름으로서 그 가행방편에 특히 수(受)의 심소(心所)와 상(想)의 심소(心所)를 싫어해서 이를 멸하는 것이니 가행(加行)에 따른 멸수상정이요, 불환과(不還果) 이상의 성자가 열반에 가입(假入)하는 상(想)을 일으켜서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니 극장(極長)이 7일입니다. 선정에 들어 너무 오래 있으면 보살의 중생 제도의 원력이 아닐 뿐 아니라 건강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력이 홍심(弘深)해서 이레 동안 이상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여기서부터는 금타 스님이 각 법문을 종합한 결어(結語) 입니다. ) 멸진정이란 색음(色陰)을 멸진함에 따라 수와 상과 행과 식 4음의 염심(染心)을 멸진하는 삼매의 명이니 초, 2지에서 색음(色陰)을 3, 4지에서 수음(受陰), 5, 6지에서 상음(想陰)을 7, 8지에서 행음(行陰)을, 또는 9, 10지에서 식음(識陰)을, 상하품(上下品) 십중오위(十重五位)로 멸진함이요 또는 십
신위(十信位)에서 색음을, 십주위(十主位)에서 수음을, 십행위(十行位)에서 상음을, 십회향위(十廻向位)에서 행음을, 또는 십지위(十地位)에서 식음을, 오중십위(五重十位)로 멸진함이니, 십중오위로는 십주위(十住位)로부터 오중십위로는 삼지(三地)부터 차제로 멸진함이니라.
곧 선수후증(先修後證)과, 먼저 닦고 뒤에 증득하는 수법이라든가 선증후수(先證後修)라, 먼저 증하고 뒤에 닦는 구별은 고사하고 색온(色蘊) 또는 이에 염오한 4온의 염심(染心)을 멸진하고 정심(淨心)에 주(住)하여 상락(常樂)의 일대인아(一大人我)를 성취하는 멸진삼매(滅盡三昧)의 이름이니라.
그리하여 4선(四禪), 4정(四定)에 이를 가(加)하고 9차제정(九次第定)이라 칭하는 바 4선, 4정은 삼승성자와 외도가 같이 닦으나 제 9의 멸진정은 성자에 한하는 동시에 외도는 법상(法相)에만 한하고 정도에 부재(不在)하며, 아(我)를 못 끊었기 때문에 정도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근기에 따라 차제로 점수하고 또는 간초(間超)와, 간초는 2지 3지 등 어느 정도 비약할 수 있고 또는 돈초(頓超)라, 돈초는 단번에 비약적으로 구경지까지 성취하는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선수후오(先修後悟), 선오후수(先悟後修)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오후수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수행의 길목을 알고서 닦는 것이요, 그 길목을 모르고서 애쓰고 닦아 가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선수후오입니다. 따라서 먼저 길을 알고 닦는 수법인 선오후수는 오수(悟修)요, 길도 모르고 애쓰고 닦다가 가까스로 깨닫는 선수후오는 미수(迷修)라고 합니다. 마땅히 정법 수행자는 선오후수(先悟楨修)가 되어야 열린 평온한 마음으로 한결 올바르게 정진하고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 오인 (五忍)과 십삼관문(十三觀門)
五忍과 十三觀門
舊譯 「仁王經」 敎化品에 「佛言大王하사대 五忍이 是 菩薩의 法이니 伏忍의 上·中·下와 信忍의 上·中·下와 順忍의 上·中·下와 無生忍의 上·中·下와 寂滅忍의 上·下를 名爲諸佛菩薩의 修般若波羅蜜이라」시교 同 受持品에 「大牟尼께서 言하사대 有修行十三觀門의 諸善男子가 爲大法王이라 從習忍으로 臺金剛頂이 皆購法師일새 依持하라 建立하니 汝等 大衆은 應如佛供養而供養之하라 應持百萬億天이 香과 妙華하야 而以奉上이라」시고 同 嘉祥疏에 「伏忍의 上·中·下 者는 習忍이 下요 性忍이 中이오 道種忍이 上이라 在三賢位요 信忍의 上·中·下者는 初地가 下요 二地가 中이오 三地가 上이며 順忍의 上中 下者는 四地가 下요 五地가 中이오 六地가 上이며 無生忍의 上·中·下者는 七地가 下요 八地가 中이오 九地가 上이며 寂滅忍의 上下者는 十地가 下요 佛地가 上」이랐으니
一에 伏忍이란 習忍·性忍·道鐘忍의 三성위에 在한 菩薩이 아직 煩惱의 種子는 末斷이나 此를 制伏하야 不起케 하는 忍이오
二에 信忍이란 初地부터 三地까지에서 貪惑을 斷盡하고 眞性을 見하야 正信을 얻는 忍이오
三에 順忍이란 四地부터 六池까지에서 嗔惑을 斷盡하고 菩提의 道에 順하야 無生의 果에 趣向하는 忍이오
四에 無生忍이란 七地부터 九地까지에서 痴惑을 斷盡하고 諸法無生의 理에 悟入한 忍이오
五에 寂滅忍이란 十地와 妙覺에서 渥槃의 寂滅에 究竟한 忍이라 忍은 忍可 又는 安忍의 義로서 其 理를 決定하고 不動함일새 十三觀門이란 上의 十四忍 中, 上 寂滅忍의 妙覺位를 除한 十三忍의 修法이라 十三觀門으로써 修하는 者를 大法王이라 云하시고 如佛供養하라시니라
이것은 인왕경(仁王經) 교화품(敎化品)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구역(舊譯) 인왕경 교화품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왕에게 말씀하시되, '오인(五忍)이 보살의 법이니, 복인(伏忍)의 상, 중, 하와 신인(信忍)의 상, 중, 하와 순인(順忍)의 상, 중, 하와 무생인(無生忍)의 상, 중, 하와 적멸인(寂滅忍)의 상, 하를 제불보살의 수반마바라밀(修般若波羅蜜)이라'하시고, 그러니까 제불보살이 반야를 닦을 때에 이 법으로 닦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왕경 수지품(受持品)에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되, 십삼관문(十三觀門)으로 닦는 선남자가 대법왕(大法王)이 된다' 공부가 성숙되어서 자성을 깨달아야 비로소 성자이나 십삼관문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정각을 성취하게 되므로 이 법으로 닦는 수행자도 법왕이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고 하면, '습인(習忍)으로부터서 금강정(金剛頂)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법사가 되어' 수행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필연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목을 모르면 어디만치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길목을 안다면 더디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종당에는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발심(眞發心)하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면 설사, 금생에 성불 못하면 몇생 뒤에라도 꼭 성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면 더디지 않는 것이지만 길을 모른다면 설령 금생에 약간의 수승한 공덕을 얻었다 할 지라도 중간에 중도이폐(中途而廢)하고 말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정다운 법에 의지하라고 세운 것이니, 그대들 대중은 마땅히 부처와 같이 공양해야 하나니 백만억천 천인들이 향과 묘화를 갖고서 받들어 숭앙한다' 하셨습니다. 아직 범부니까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십삼관문으로 닦는다면 일반 대중들은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할 것이며, 백만억천 무수한 천인들이 십삼관문으로 수행하는 이들을 꽃과 향으로써 받들어 숭앙한다는 말입니다.
동(同) 가상소(嘉祥疏)에 '복인(伏忍)의 상, 중, 하는 습인(習忍)이 하요, 성인(性忍)이 중이요, 도종인(道種忍)이 상이라, 이것이 재3현위(在三賢位)요' 아직 성자의 지위가 되기 전에 닦아 나가는 과정들을 인법(忍法)이라는 명분으로 가른다면 이른바 복인인데, 복인(伏忍)에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은 번뇌를 다는 떼지 못하고 조복시킨다,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견도할 때, 견성오도할 때는 단(斷)이요, 그전에는 복(伏)이라는 말입니다. 복(伏)이란 제복(制伏)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써서 조작(造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끊어 버리면 조작이 없이 임운(任運)이 되는 것이지요. 화두나 염불이나 주문이나 공부를 익혀 나가는 습인(習忍)이 하(下)고, 더욱 익혀서 확신이 서가는 정도인 성인(性忍)이 중(中)이요, 그 다음은 도종인(道種忍)이라, 이미 확실히 신해(信解)가 생겨 가지고 우리 잠재 의식에다 종자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한사코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종자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도종인까지는 아직은 현위(賢位)요, 성자의 지위는 못됩니다.
그 다음에 '신인(信忍)의 상, 중, 하는 초지가 하요' 초지부터는 이미 환희지를 성취한, 곧 견도한 성자입니다. 그리고 초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보살십지에 의거한 것입니다. '2지가 중이요, 3지가 상이며' 복인에서는 현자라 하더라도 아직은 성자가 아닌 범부지이므로 이런 현자의 지위는 확실한 깊은 신앙 즉 정신(正信)은 아직은 못 갖고 항시 의단(疑團)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진여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상(相)도 미처 여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지에서 견도하면 그때는 확실히 불성을 보기 때문에 비로소 참다운 정신(正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信忍)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인(順忍)의 상, 중, 하자는 4지(地)가 하요, 5지가 중이요, 6지가 상이며' 순인이라고 한 것은 법성(法性)에 수순해서 조금도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없고 삼업(三業)을 여법히 청정하게 행위한다는 말입니다.
'무생인(無生忍)의 상, 중, 하자는 7지가 하요, 8지가 중이요, 9지가 상이며' 무생인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온전히 체험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멸인(寂滅忍)의 상하자는 10지가 하요, 불지(佛地)가 상이라고 하였으니 적멸인에는 중(中)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찰나이기'때문에 가운데다 중(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에 복인(伏忍)이란, 습인·성인·도종인의 3현위에 재(在)한 보살이 아직 번뇌의 종자는 끊지 알았으나 이를 제복하여, 억제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인(忍)이요,
2에 신인(信忍)이란, 초지부터 3지까지에서 탐혹(貪惑)을 단진(斷盡)하고 진성(眞性)을 견(見)하여 정신(正信)을 얻는 인(忍)이요, 따라서 보살 초지부터는 견도(見道)지위입니다.
견도지위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생성(異生性)이라는 범부의 성품을 떠나서 성자의 참다운 성품인 정성(正性)이 되므로 견도할 때를 가리켜 정성리생(正性離生)이라 합니다. 즉 범부가 사물을 바르게 통찰을 못하고 달리 볼 수밖에 없는 분별시비를 떠나서 정성인 진여불성 경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3지까지에서 탐혹을 단진하고 진성을 견하여 비로소 바른 신앙을, 확고부동한 후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3에 순인忍)이란, 4지부터 6지까지에서 진혹(瞋惑)을 단진하고 보리(菩提)의 도에 순(順)하여 무생(無生)의 과(果)에, 불생불멸의 과에 취향(趣向)하는 인이요,
4에 무생인(無生忍)이란, 7지부터 9지까지에서 치혹(痴惑)을, 탐·진·치 번뇌 가운데 탐혹은 가장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진혹이 끊어지고 마지막에 무명인 치혹을 단진하고 제법무생(諸法無生)의 리(理)에, 모든 법이 불생불멸한 뜻에 깨달아서 들어감이요.
5에 적멸인(寂滅忍)이란, 10지와 묘각(妙覺)에서 열반의 적멸(寂滅)에 구경(究竟)한 인(忍)이라, 열반 곧 적멸에 사무쳐 다 깨달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忍)은 인가(忍可) 또는 안인(安忍)의 뜻으로써, 인은 참을 인자 아닙니까? 진여의 도리를 확실히 믿고 안주하며, 편안히 머물러 동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3관문이란 위의 14인 중, 복인에 3이 있고, 신인에 3, 순인에 3, 무생인에 3, 적멸인에 2가 있어 14인(忍)인데, 상적멸인의 묘각위를 제한, 적멸인이 바로 묘각이므로 제하고서 13인(忍)의 수법(修法)이라, 수행하는 과정이 13인의 수법이라 13관문으로 닦는 자를 대법왕(大法王)이라 말씀하시고 여불공양하라 하시니라 곧 부처같이 공양하라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두에서 말씀드린 선오후수(先悟後修)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석가모니께서 출현하셨을 때에 다른 위대한 성자가 계셨더라면 석가모니께서도 6년 고행이나 그렇게 많은 수도를 안하셨겠지요,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나오셨더라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인생과 우주의 모든 길을 온전히 밝혀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길목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목을 모르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증선(暗證禪)이라, 우리가 암중모색한다는 말입니다. 내 공부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자기 점검을 못하고 또는 다른 이들의 정도를 간별을 못합니다. 도인이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지 우리가 저 분이 어느 정도인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십삼관문(十三觀門)같은 법문을 안다면 자기 공부 길에도 헤매지 않고 다른 수행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