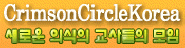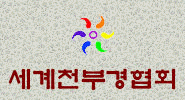글 수 5,680
봉우 권태훈의 생애와 사상
차 례
● 1. 머리말
● 2. 생 애
● 3. 사 상
1)선도(仙道)사상 2)민족주의 3)문명비판론/황백전환론/백산대운론/
● 4. '단(丹) 현상'의 발생배경과 사회적 영향
● 5. 맺음말
● [참고문헌 및 자료]
--------------------------------------------------------------------------------
머리말
인간은 누구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 무수한 인간들의 삶이 모여 결국은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고 무한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무수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유독 역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역사에다 자기의 흔적을 진하게 남겨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지만, 생을 마감하는 순간 역사의 인물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역사 속에서 파악한다.
1980년 중반에 '단(丹)'이란 책의 발간과 함께 한국사회에 강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0년대 중반에 그 인물은 세상을 뜬다. 그 인물과 행적, 사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했으며, 특히 그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등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봉우(鳳宇)를 역사상의 인물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단계가 되었다. 역사 속에서 정당하고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일으킨 파장 속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새롭고 특이한 성격과 행적을 남긴 봉우(鳳宇)란 호를 가진 권태훈(權泰勳)이란 실존인물을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첫 작업이다.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인물의 특이한 성격과 현대인의 통념을 뛰어넘는 행적, 다양한 이론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유형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 행적을 알려주는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는 역사화를 위한 1차 작업이라는 전제를 깔고,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자 한다. 봉우사상의 형성배경과 사회적 영향 등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문명, 사회의 진로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생 애1)
한 인물의 성격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생애의 전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견해, 특정한 사상과 행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면 그의 전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태생과 관련하여 그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봉우는 1900년 음력 정월에 서울 재동(齋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洞)이고, 자(字)는 윤명(允明) 또는 성기(聖祈)였으며, 아명은 인학(寅鶴)이었다. 호는 여해(如海), 봉우(鳳宇), 물물(勿勿), 연연(然然) 등이 있다.
그는 특별한 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2) 아버지는 당시 세도가인 안동 권씨가인 권중면(權重冕)으로서, 대한제국의 내부 판적국장(內部版籍局長)이었다. 권중면은 그후 한성재판소 판사비서원승(判事秘書院丞), 시종원(侍從院) 시종 등을 거친 후 평산군수(平山郡守), 진도군수(珍島郡守) 등을 역임하면서 당시의 중요한 내외관직을 두루두루 거쳤다.
서기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는데, 당시 을사오적 가운데 하나인 농상대신 권중현(權重顯)은 권중면의 형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봉우의 아버지는 형제간의 의를 끊었으며, 그후 1907년의 정미칠조약을 계기로 벼슬에서 떠났다. 이렇게 집안과 국가에서 격심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시기에 봉우는 서울을 떠나 진도에서 어린 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숙부인(淑婦人) 경주 김씨로 그에게 커다란 정신적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그가 6세 때에 조식법(調息法)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선도(仙道)의 세계로 입문하는 첫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한 가계와 집안 분위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봉우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린 날을 보내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유교경전들을 섭렵하기 시작하였으며, 10세 때인 1910년에는 서울 종로의 마동(麻洞)에 있는 단군교 포교당에서 홍암 나철 대종사(弘巖 羅喆 大宗師)를 뵙고 수교(受敎)하였다. 이 일은 그후 봉우가 계속 대종교와 관계를 갖는 근거가 되었으며, 말년에 대종교의 총전교에 취임하는 바탕이 되었다.
서기 1910년 한일병탄이 되자 집안은 충북의 영동(永同)으로 낙향하고, 봉우는 영동의 보통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곳에서 수학 등 근대학문을 접하게 된 봉우는 일본 유람단으로 첫 번째 도일을 한다. 봉우는 이 시기에 민족적 현실을 자각한 듯하다. 한국인 교사인 박창화(朴昌和)에게서 애국심을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13세 때 조선 선도계의 거인인 우도방주 김일송(右道坊主 金一松) 선생을 뵙고 인연을 맺게 되었다. 15세에 두 번째로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당시 일본의 정신계 거두인 원선불(原仙佛), 기바라(木原鬼佛) 등과 교유를 하고 일종의 경쟁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잠시동안 기바라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때 이미 그는 체술과 검도 등을 익힌 상태였다고 한다.
19세인 1918년에 이르러 그의 일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우도방주 김일송(右道坊主 金一松)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월산에 입산하여 3개월간 선도 수련에 입문하였다. 이때 좌도 우도의 여러 가지 심법(心法) 등을 전수받았다. 이후 인천에서 산주 박양래(汕住 朴養來) 등 선도계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20세 때인 1919년에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봉우는 동해안을 따라 항구를 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후에 만주로 들어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노은 김규식(蘆隱 金圭植) 장군 부대의 일원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독립군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국내로 잠입하여 지하운동을 하였으며, 한때는 영어(囹圄)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25세 때에는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전생(前生)을 확인하였고, 당시 도계의 최고 신선이라는 왕진인(王眞人)을 만났다. 이때를 전후한 시기부터 그는 선도수련에 정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반들을 모아 정신수련을 하였고, 32세 때에는 계룡산에 연정원(硏精院) 건물을 지었으며, 49세인 1948년에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용산 연정원(龍山 硏精院)을 열었다. 해방 이후에는 한독당(韓獨黨)에 가입하여 정치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3)
이후 봉우는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을 치른 듯하다. 그의 일기를 보면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까지도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투옥당하는 등 적지 않은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심경은 그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60세 때에 연정원을 신축하여 수련을 하면서 공주에 칩거생활을 하였다. 65세 때에 상경하여 한의원을 개업하였으나 사회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3세가 되는 1982년에 대종교의 최고지위인 총전교에 취임하게 된다. 2년 후인 1984년에 '단(丹)'이란 책을 통해서 선인(仙人)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단의 열풍을 일으킨 봉우는 1986년에는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설립하고 총재에 취임하였다. 1989년에 수필집 『백두산족에게 고함』『천부경(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를 출판하였고, 93세 때에는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95세 때인 1994년 5월 공주 반포면 상신리(上莘里)에서 운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의 생애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이제 그가 주체로서 실천한 행적을 토대로 생애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는 선도인(仙道人), 종교인, 사상가, 민족운동가, 한의사 등 여러 모습을 지녔으나 역시 가장 대표적이고 모든 행적과 사상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선도수련이었으므로 선인(仙人)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강했다고 판단된다.
봉우는 6세 때부터 조식법(調息法)을 익혔으며, 이후 계속해서 정진하였다. 13세 때 당시 선도계의 거인인 김일송 선인과 인연을 맺은 이후 선도수련을 본격적으로 행하였다. 그후 삼비팔주(三飛八走) 등 선도수련가들과 교유를 하였으며, 일찍부터 도반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수련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단을 비롯한 서적을 발간하여 선도를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재래의 선도수행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화하였다.
그는 예언가로서의 풍모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자탄의 발명과 일본의 멸망을 예언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도 1951년에 예언하였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관련해서는 남북의 통일과 중국의 분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하였으며, 유불선(儒佛仙) 등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연구에도 깊이 천착하여 일정한 견해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자연히 민족과 국가는 인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인류의 문명에 비판하며 미래를 전망한 문명비평가로서의 모습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한민족의 역사와 사상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를 수립하였으며, 천부경(天符經)을 비롯한 각종 경전을 해석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
1) 봉우의 생애 중 중요한 부분은 『봉우일기(鳳宇日記)』(권태훈, 정신세계사, 1998)에 실린 연보를 참고.
2) 1985년 당시 이루어졌던 글쓴이와 대화내용 중에서.
3) 일제시대와 해방정국에서 봉우의 활동 가운데 더욱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술을 토대로 검증작업 진행중.
--------------------------------------------------------------------------------
사 상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다양한 행적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는 거의 모든 일에 관심을 쏟았고, 또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일정한 견해를 세우고 있었다. 특히 역사, 예술, 의술, 체련, 호흡법 등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리를 세우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그의 사상을 논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글의 성격과 그에 대한 첫 소개라는 한계를 감안하면서 여기서는 봉우사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고자 한다.
1) 선도사상(仙道思想)
그는 유불선의 여러 사상을 두루 섭렵하였으나 주로 선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였던 민족종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종교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은 듯하다.
대종교와의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맺었으며, 말년에는 대종교의 총전교를 지냈다. 그래서 그를 종교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는 출생배경과 집안의 분위기, 성인이 된 이후의 행적으로 보아 특정한 종교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나는 다만 유불도나 외래종교들은 우리 민족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종교에 뜻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4) 자신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종교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6세 때부터 시작한 호흡법을 기본으로 생애 내내 선도수행에 열중하였고, 예언·사상 등도 역시 그에 기초한 것이 많았다. 그에게 있어서 선도란 사상과 행위, 사회적 역할을 위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었다.
그의 선도는 몇 가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공개적이고 일반화되었다.
선도는 수행방법은 물론 조직·논리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 '비인물전(非人勿傳)'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수행자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늘 비의적(秘儀的)인 측면이 강했고, 이는 필수적으로 신비적인 분위기를 풍겼으며, 선도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받게 하는 소이가 되었다. 이러한 기본성격 때문에 선도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사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종교가 되지 못했으며, 학파를 이루지 못하여 사상사의 흐름이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진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봉우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중의 하나는 일찍부터 학인(學人)을 모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19세 때인 1918년에 계룡산에서 수련결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에 걸쳐 집단수련을 하고, 32세인 1931에 연정원을 설립하였다. 특히 1984년에 '단'의 출간을 계기로 선도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각종 기회에 강의·강연은 물론 저술활동도 하였으며, 1986년에는 연정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선도수련의 실제와 과정 내지 선도인들의 활동이 허구나 공상의 산물이라는 통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잘 알려진 역사상의 인물들은른 물론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실명으로 등장시키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물론 이러한 사실과 예들은 봉우의 증언에 의거하고 있어 추후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선도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인 태도는 선도가 일반화되고 조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선도 혹은 이와 유사한 흐름이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각종의 변형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특히 일상생활을 벗어나 도의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바람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선도가 고구려의 조의선사(皂衣仙人), 국선(國仙), 신라의 화랑도(花郞徒) 등 전래 우리 민족의 보편적으로 접하고 수련해 온 것이었다면, 이로써 오랜만에 선도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복권(復權)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그의 선도(仙道)는 현실적이고 역사성이 강하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존의 선가·도가(仙家〕家) 혹은 선교·도교(仙敎〕敎)는 현실 도피적이거나 은둔적이었다. 선도에서 축구하는 것은 선인(仙人)이 되는 것이다. 이때 선인이란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무관하고, 심지어는 생명이란 존재를 버리기까지 한다. 설사 물리적인 생명을 연장시킨다 해도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하는 생명과 생활은 아닌 것이다. 개인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선도의 개념이다.
봉우는 민족이 겪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장한 때문인지, 아니면 선도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 때문인지, 기존의 선도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선도의 본질은 결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만 우리의 불운한 역사과정 속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의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주체적인 민족의 고유사상이 역사의 주류로 나서지 못하고 잠복한 채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 이는 선도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과정을 일치시킨 매우 특이하고 진일보한 해석으로, 그의 말대로 그의 생애가 맞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봉우는 특히 인간의 일상과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강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인간 개개인에게 애정을 느꼈고, 생애 내내 자신의 존재와 능력으로써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움직였다. 특히 선도는 인간의 구원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민중들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낀 그는 자신의 능력과 의술을 베풀어가면서 많은 활인(活人) 행위를 하였다. 예를 들면 질병(疾病)이 돌았을 때 구제를 한 것이라든가, 노년에 한의원을 경영한 사실 등은 그러한 그의 선도관을 반영한다. 그는 젊었을 적에 의술에 능한 선도인들과 함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술하고 있다.6) 특히 단순한 활빈(活貧)이 아니라 의술을 선도와 접목시켜 체계화하는 단계로 진일보시켰다. 전통의학론을 펴고, 현 의료정책을 비판하였으며, 미래의학에 대한 전망과 선도적(仙道的)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였다.7)
그는 인간 자체, 개개인의 삶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역사의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일제시대 선도인들은 민족의 정치적 현실과 민중들의 빼앗긴 삶, 그리고 민족종교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예정론을 내세우며 민족의 모순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했다. 그에 반하여 봉우는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민족모순을 인식하였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선도인들은 언제 일본이 멸망하고 조선이 독립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봉우는 이미 예정된 천지도수(天地度數) 속에, 즉 곧 다가올 조선의 독립은 민족의 노력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8) 그는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권총잡이로 업을 지으면서까지도 살생을 저질렀다고 한다.9) 이는 봉우의 개인적인 가치관 외에도 당시의 민족운동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대종교인들은 북로군정서에서 군인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김좌진·이범석 등 대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북로군정서의 총재인 독립운동가 백포 서일(白圃 徐一)은 대종교의 교리와 철학적 논리를 연구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교주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대종교의 조식법(調息法)으로 자결한 선도 수련가였다. 봉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선도 수련의 일종인 비보(飛步)·속보(速步) 등의 능력을 활용해서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봉우의 이러한 면은 기존의 선도가 지닌 초역사성(超歷史性), 탈역사 인식(脫歷史認識)을 극복하여 역사성을 지닌 사회사상으로 질적 전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형성된 봉우의 선도 사상은 현실적이었으므로 실제생활에 응용하고 수련자나 집단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는 평소에 '거거거중지(去去去中知) 행행행리각(行行行裏覺)'이란 가다 가다 가는 가운데 알 게 되고 하다 하다 하는 속에서 깨우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그가 행위의 측면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런한 봉우의 태도는 민족체술(民族體術)의 복원과 현대적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민족체술이란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전래의 체술이 고구려·백제·신라에 이르러 각각 독특한 성격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여 모든 백성들이단련한 체육법이었다. 봉우에 따르면 이 체술이 있었기에 민족이 발전하고 특히 수, 당 등 중국의 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점점 문약(文弱)해져서, 결국 민족체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봉우는 자신의 목격담과 실제체험, 전승 등을 토대로 이러한 민족체술의 존재를 설명하고, 그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복원하였다.10)
말년에 봉우는 86아시안게임가 88올림픽을 계기로 이러한 민족체술과 선도수련을 실제생활에 접목하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웅비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시도도 하였다. 봉우는 특히 비보(飛步)와 속보(速步)를 마라톤 등 육상경기에 활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체육인을 통해 그러한 시도도 하였다. 비록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이후 선도적인 방법론, 기(氣)의 인식과 그 활용, 참선 등이 각종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봉우는 체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전심수(口傳心授)로 극비리에 내려오던 것을 복원하여 일부를 체계화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현실과 역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고민했던, 선가(仙家)로서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선도의 개념을 변화시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하였고, 그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봉우는 단순한 선도 수련인이 아니라 이론가, 철학자, 종교인의 범주를 뛰어넘어 실천가, 운동가로서으 면모를 갖춘 사상가로 평가할 수가 있다.
2) 민족주의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잇는 것은 민족주의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계(家系)와 어린 날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는 태생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더구나 그가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낸 20세기 전반은 일본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상실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 지향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는 자연히 민족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전래의 선도인들은 선도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민족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봉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관념이나 사변이 아니라 단학수행과 인식을 통해서 민족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라 없는 도인(道人) 없고, 나라 없는 학인(學人) 없다"는 그의 말은 선도와 민족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다.
봉우는 단(丹)을 유·불·선(儒佛仙)으로 근원을 파악했는데, 이는 현묘지도(玄妙之道)라고 칭한 풍류도(風流道)에 대한 최치원의 해석과 일치한다. 그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화랑도(花郞道)를 해석하면서 단순히 화랑의 무리[徒]가 아니라 '화도(花道)' '낭도(郎道)' '도도(道道)'라고 하여 기능에 따른 분류임을 말했다. 그리고 선(仙)은 단군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기에, 선을 수련함으로써 홍익인간 이념의 현세적 실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민족적 이상을 더 구체화시키고, 인류문명의 범주로 확대시켰다. 즉 황백전환론(黃白轉換論)을 주장하면서 인류역사에 정신문명이 도래하는데 이는 홍익인간 이념의 현세적 실현이라고 하였다. 그를 위해서 모든 이들의 단학수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봉우는 선도를 민족을 정체성을 찾고 확립시키는 길잡이로서 인식한 것 같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해방 이후의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의 역사는 상당부분 훼손되고 고유한 정신력은 오염되었다.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도 희미해졌고, 문화적인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봉우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몇 가지 독특한 주장을 하게 된다.
먼저 '대황조론(大皇祖論)'이다.
그는 "대황조는 우리 겨례의 첫 조상이 되는 분으로서 '큰 할배'라는 뜻이다.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단군을 모시고, 터주에 고사를 지냈다. 그런데 신라 말엽에 당나라를 모방하려는 바람이 불어서 전래하던 역사가 말살되었다. 그러나 단군이 우리의 대황조이며, 또 우리 나라 최초의 임금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11)라고 하면서, 불교 이후에 대황조에 대한 숭배심이 약해졌으나 이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숭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그는 단군을 재해석하고 더욱 강한 의미를 부여해서 민족과 역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을 추진하였다.
또 하나는 '백두산족론(白頭山族論)'이다.
그는 '백두산족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에 따르면 백두산은 첫 조상인 단군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교화의 터를 잡은 성스러운 산이다. 그는 또한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룩된 고대문화의 창시자이며 담당자라고 하여 민족의 발원을 백두산에다 두고 있으며, 동양사상이 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그는 백두산족을 동이(東夷)와 연결시키고도 있으나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봉우는 백두산의 상징성을 매우 중요시하여 정신적 이정표로 삼고 있다. 1990년 백두산 천지에서 천제(天祭)를 봉행한 것도 대종교 총전교라는 지위와 아울러 백두산족 혹은 백두산 문명을 주장하는 그의 사상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래에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있어왔다. 하지만 봉우는 그의 지리론(地理論)과 국도론(國都論)을 통해 백두산의 역사성을 언급하고 백두산족의 시원과 역사과정,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하였으며 단군의 첫 수도, 영토, 통일 후의 수도, 그 이후의 수도와 영토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물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근대 역사학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그 타당성과 사실성 여부를 떠나 한 시대의 사상적 흐름으로서 평가의 가치는 있다. 그리고 근대역사학 이전에도 역사학은 있었듯이 미래에도 역사학은 있을 것이고, 그때 역사학의 방법론이 현재와 반드시 동일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또 하나 봉우가 제기한 것은 '한민족 역할론'이다. 그가 '백두산족'으로 명명한 한민족이 이 시대의 민족사 혹은 세계사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그는 문명비평가의 모습을 띠었다.
3) 문명비판론
봉우는 문명비평가로서 '황백전환론(黃白轉換論)'과 '백산대운론(白山大運論)'을 주장한다.
'황백전환론(黃白轉換論)'
근대 이후의 세계는 서구 중심의 문화가 주도해 왔다. 그에 따라 물질문명이 팽배하고 정신문명은 위축되거나 사라져 갔다. 조화와 협력을 지향하여 우주의 일체됨을 추구하기보다는 갈등과 투쟁을 토대로 우주의 분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문명의 창조는 물론 그것을 누리는 주체 또한 서구인이었다. 비서구인은 늘 주변부에서 개체 또는 종속적인 존재로 머물고 있었으며, 때로는 심한 억압을 당하였다.
봉우는 이러한 현대문명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즐겨 사용한 '물극필반(物極必返)'이라는 표현은 그가 세기말에 이른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황백전환론'이며, 특히 문명의 주체가 백인에서 황인으로 통해서 단계적으로 형성되고 논리화된 것이다. 그러나 선도 수련인인 이상 일반인들의 사상화 작업과는 다른 면이 있다. 즉 그는 천지도수의 변화, 원상(原象), 산법(算法) 등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화탄(電火彈, 원자탄)의 발명과 일본의 멸망을 예견하였다. 또한 이미 1950년대 초의 일기에서 소련의 몰락을 예견하였는데, 30년 뒤 정확히 실현되었다. 그는 이어 남북통일과 중국분할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흑만탄과 평화탄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황백전환론의 견지에서 해석하고 있다.
'백산대운론(白山大運論)'
그는 이러한 인류사의 황백전환론이 우리 민족에게 '백산대운론'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한다. 문명의 변화에서 수동적 객체나 주변부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 즉 변화의 주체세력이라는 것이다.
'백산'은 백두산을 의미하고, '백산대운'은 백두산족의 큰 운명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이 운은 황백이 전환되는 인류사의 대전환기에 기존의 백인문화를 대체하는 황인문화의 주체가 바로 백두산족이라는 것이다. 이 운은 3천 년만에 돌아온 것으로서, 앞으로 5천 년을 이어가는 대운이라고 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산법(算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천문관측에 의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손수 작성한 관천록(觀天錄)에서 단기 4317년(서기 1984년)부터 60년간 백산대운이 토대가 마련된다며 그 현상과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결국은 21세기 신문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역할론 속에서 선도수련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가치가 인식되는 것이다. 그는 선도수련을 종래에 이해하고 있었던 신선술이나 장생술, 특이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일꾼을로 거듭가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체계 안에는 조상 전래의 지력(智力)·체력(體力)·덕성(德性)을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련하여 고유한 민족문화의 계승자가 되고 신문명 창조의 주체적인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다시 말하면 신문명과 신질서에서는 선도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한민족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열린 민족주의로서 세계와 연결되고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지녔으므로 그는 산법(算法), 예언(豫言), 관천(觀天), 원상(原象), 호흡수련을 통한 회광반조(廻光返照) 등 일반인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신비적이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또한 도가(道家)나 선가(仙家)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을 했던 혁명적인 현실론자로 평가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상과 같은 그의 행적과 사상은 살펴볼 때, 그는 종래 개념의 선인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고 역사인식에 투철했던 민족주의자였으며, 문명을 비판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문명비판가의 모습을 갖춘 신개념의 선인(仙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백두산족에 고함』봉우 권태훈, 정신세계사, 1988, 214~215쪽.
5) 위의 책, 66쪽.
6)『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봉우 권태훈 옹 구술 및 감수, 안기석 연구, 정재승 엮음, 정신세계사, 1988. 2부 2장 2편 명의일화(名醫逸話)편 참조.
7) 위의책, 제2부 2장 참조.
8) 오성(五星)과 오복성(五福星)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인간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민족지성」1986년 11월호, 필자와의 대담.
9) 1986년 필자와의 대담내용.
10) 위의 책, 제2부 3편 참조.
11) 『백두산족에게 고함』68~69쪽.
12)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봉우 권태훈 옹 구술 및 감수, 안기석 연구, 정재승 엮음, 정신세계사, 1988년, 300~301쪽.
13) 『백두산족에게 고함』66쪽.
--------------------------------------------------------------------------------
'단(丹-仙)현상'의 발생배경과 사회적 영향
'단(丹)'이란 책을 통해서 봉우 선생의 존재와 사상이 알려진 이후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단'은 출간 이후 서기 1997년까지 약 80만 부가 팔렸다. 물론 봉우의 집필, 구술 또는 감수를 받아 펴낸 책들도 있었다.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서적, 혹은 단학 내지 동양사상과 관련된 책들이 수십 종이나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에서 언급한 민족의 자의식과 관련하여 다수의 재야민족 사서류(在野民族史書類)가 출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단으로 표현된 선도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행위와 실천, 즉 건강·과학·예술·문학 등에도 영향을 끼쳐 이른 바 '단(丹)신드롬'을 낳기도 하였다. 특히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여겨졌던 기(氣)의 존재를 일반화시켜 과학적인 접근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생겨난 한국정신과학학회는 기의 존재를 연구하는 과학자 및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그밖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현상의 하나는 기를 수련하는 건강관련 단체와 강좌들이 수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각종 단체와 강좌, 심지어 대학교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기수련을 하는 인구는 백만을 육박한다고 한다. 단을 매개로 민족문화운동을 펼치는 한문화운동과 같은 움직임도 있으며,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도 단과 관련하여 기수련을 하는 단체와 도장이 여러 곳 생겨났다.
한편 단에 대한 관심은 음성적이고 비공개적이었던 동양문화와 한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개적인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과 그 사회적 영향은 무엇일까?
단에 대한 관심과 봉우의 사상 내지 실천에 관심이 증대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선 한민족의 존재와 민족사상 내지 역사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봉우 자신의 증언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선도나 단학의 사실성이나 실존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단군 및 고대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학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은 물론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역사와 맥이 닿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과 기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포괄적인 의미의 민족주의 흐름을 불러 일으켰고,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켰다. 단과 기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른 바 '단 신드롬'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민족의 역사나 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좀더 희망적으로 관측하려는 이른 바 민족주의자들이다. 둘째는, 도(道)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헤매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스승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단'에 나타난 초능력에 호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가 이익을 얻어보자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첫 번째 부류임을 부인할 수 없다.14) 이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이 아니라 수련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자아와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강렬하고 심도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다. 수련자들이 민족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도가 지닌 이러한 면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현대, 특히 1980년대의 민족적 상황 때문이다.
1980년대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혼재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결과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진 반면 정신적으로는 매우 궁핍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허감과 정신적인 허기를 채워줄 양식이 필요했다. 특히 1970년대의 유신과 1980년의 광주항쟁, 곧이은 군사정권의 등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성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자아의 인식과 확인을 향한 욕구가 공개적이고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불완전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흐름의 한 갈래로서, 체제유지와 문화의 보수성을 고집하려는 세력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체제와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요하고 가장 역동적인 흐름이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였다. 특히 내부모순의 실상을 당시의 정치환경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그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이들은 자신의 이론을 서구문화, 즉 마르크스주의를 근간으로 한 서구사상에서 빌려왔으며 실천방법 또한 서구의 경험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유예와 검증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특히 동양적 세계관, 전통문화와 논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물론 이 흐름의 주체는 조직화가 가능한 학생과 노동자 계층이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은 바로 본고의 주제인 선(仙)·단(丹)운동 내지 '봉우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80년대는 보수와 개혁 혹은 혁명의 대결구도가 심화되어 운동량이 폭발적으로 팽배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현실적인 이 흐름은 사회과학적인 논리로 포장되지 못했고, 정치나 사회운동의 일선에 나서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본적으로 조화와 협력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이들의 논리는 투항과 배신의 논리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의 민족지향적인 면은 국수주의나 체제유지적인 것으로 곡해당하기도 하였다. 물론 실제로도 체제유지자들에 의하여 이용당한 측면이 일부 있었고, 활동의 주체가 조직화되지 못한 데다가 실천력도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그 흐름은 비록 1980년대 역사의 주류가 아닌 지류였고 잠재된 흐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안에 몰현실적(沒現實的)인 요소가 있고 비과학적,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회현상과 구조에 대해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시대에 인간의 본질과 피안(彼岸)의 세계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고, 그 실현방법을 실생활의 영역 속에서 찾아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투적이고 속도전에 매몰되어 가던 한국 사회의 한켠에 '느림'과 '안정'의 분위기를 던져 주었으며, 왜소해진 현대인들로 하여금 신비와 꿈의 영역에 깃들 게 하기도 하였다. 특히 왜곡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열등감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해 주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한민족의 정체성을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는 물론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 점은 우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
맺음말
봉우는 현실의 인물로 태어나 현재적 삶을 살았고, 역사적인 인간으로 남은 선인(仙人)이다. 그의 일생가 행적이 현대인들에겐 비록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현상들이 엄존하고 그 영향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생애와 사상, 그로 인하여 나타난 사회적 현상들은 반드시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필자는 봉우 권태훈(鳳宇 權泰勳)이라는 신비스럽고 복잡한, 현시대와는 거리를 둔 것 같은 인물을 역사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첫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많은 한계와 미비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검증문제가 앞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화의 큰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대상인 봉우 자신의 구술과 기록에 의존한 결과 객관성을 결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그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은 전혀 고찰되지 못하였다. 이 점, 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검증작업을 통해 비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의 선도수련·체술·의학·문명관 등은 주제별로 더욱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봉우의 행적이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의 현대, 특히 1980년대 사회운동에서 선도적 흐름의 위치와 역할 등을 여러 각도에서, 특히 다른 사회운동 및 문화운동과 연관지어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의 과제로 넘기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심도 깊고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및 자료]
『봉우일기』권태훈 저, 정재승 편, 정신세계사, 1988.
『민족비전(民族秘傳)』봉우 권태훈 감수, 정재승 편저, 정신세계사, 1992.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봉우 권태훈 구술 및 감수, 안기석 연구, 정재승 엮음,정신세계사, 1989.
『백두산족에게 고함』봉우 권태훈, 정신세계사, 1989.
『민족지성』2호, 1986년 11월
『단(丹)』김정빈, 정신세계사, 1984.
각종 신문 및 잡지기사.
생존시 필자와의 대담 기록.
제자들과의 인터뷰 기록.